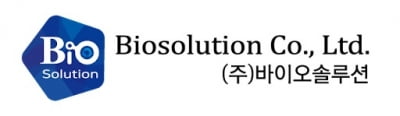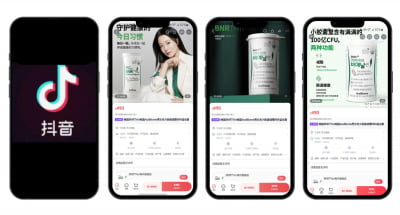한국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모바일 프런티어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선 그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로 스마트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에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웨어러블이 성공하기 위해선 네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가지 문제란 △웨어러블 기기를 구매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효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배터리 시간 등의 기술 장벽 △어떤 가격이 적절한지 소비자와 제조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점 △정부의 규제 등을 말한다.
다른 발표자들 역시 웨어러블을 포함한 사물인터넷(IoT)의 부상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많은 업체가 IoT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강조됐다.
심수민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만난 한 중국 IT기업 임원이 ‘저가로 비슷한 제품을 쏟아내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못 버티겠다’고 할 정도”라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웨어러블 기기가 1만8000개 나온다”고 말했다.
결국 하드웨어보다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경쟁력의 근간이 있다는 게 심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컬러TV는 마돈나 때문에 널리 퍼졌고, 할머니부터 꼬마까지 스마트폰을 갖게 된 것은 카카오톡 때문이었다”며 “반면 3D TV는 볼 만한 콘텐츠가 없어 판매가 시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작정 IoT 기기를 만들어 팔기보단 ‘킬러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또 IoT 분야에 뛰어든다면 헬스케어와 스마트카, 스마트홈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홈은 IoT의 핵심 콘텐츠인 에너지와 헬스케어, 자동화의 최종 수요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윤석 가트너 상무는 “기업은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항상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부의 변화 속도가 내부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 조직의 끝은 바로 앞에 있다”는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모바일 시대에 맞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내부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