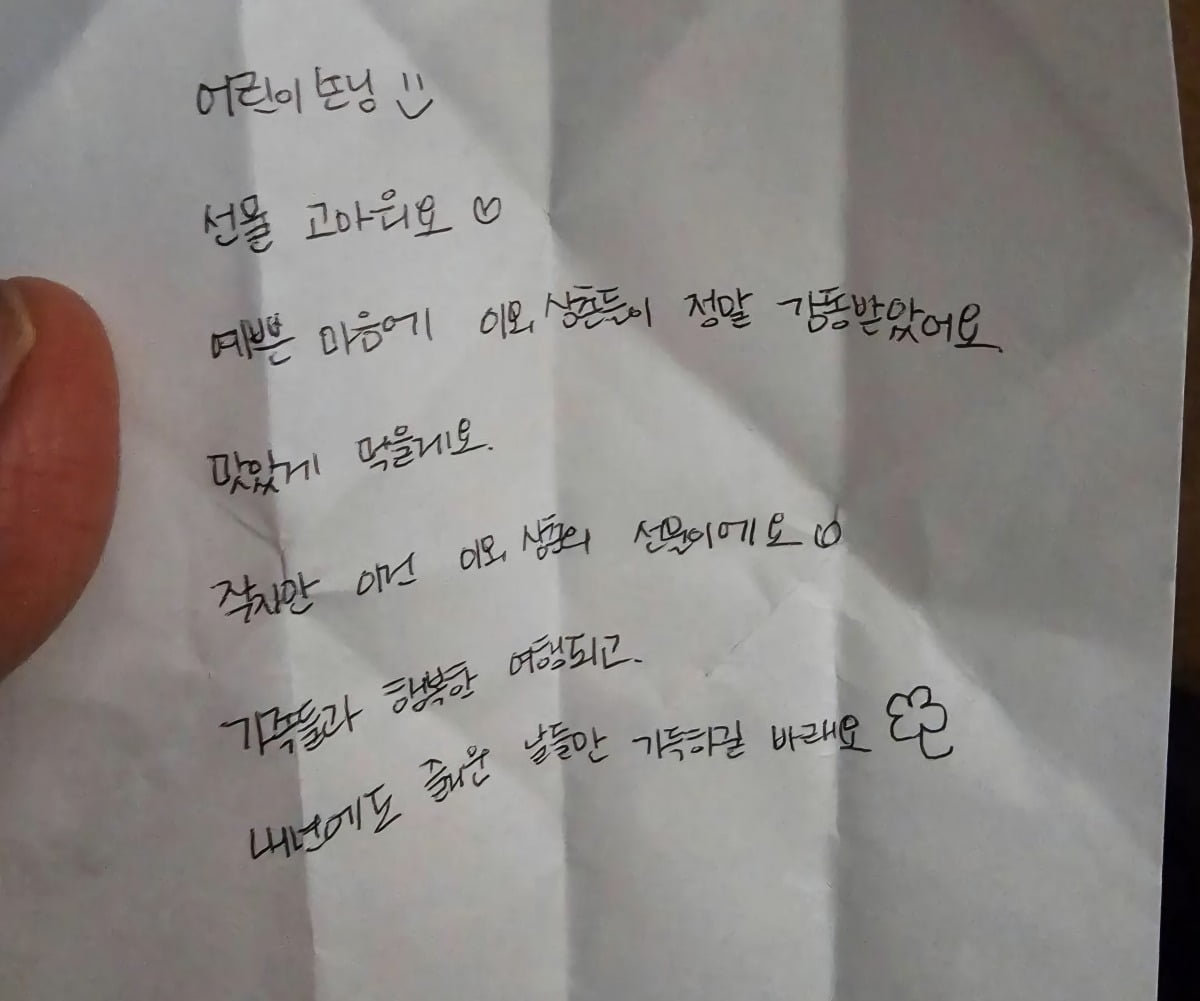말 그대로 소주는 불로 만든 술이다. 술의 어원도 ‘수불(水火)’이다. 소주는 불을 이용해 만들어 ‘화주(火酒)’, 이슬처럼 한 방울씩 모아 ‘노주(露酒)’, ‘한주(悍酒)’로도 부른다.
소주의 유래는 신라설과 고려설이 있다. 신라설은 아라비아 연금술사들의 증류기술이 당(唐)과 신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신라 괘릉의 서역 무사상(像), 페르시아 유리잔 등이 그 증거다. 반면 고려설은 페르시아를 거쳐 몽골에 전래된 증류술이 몽골의 일본 원정 때 들어온 것으로 본다. 소주가 발달한 개성, 안동, 제주 등이 몽골군 주둔지였다는 것이다.
지금 마시는 소주는 1924년 장학엽이 평안도 용강에 진천양조상회를 세워 ‘진로(眞露)’를 생산한 것이 원조다. 진로는 6·25 이후 서울 신길동에 정착하면서 상징마크를 평안도에서 영물로 치는 원숭이에서 두꺼비로 바꿨다. 진로도 처음엔 쌀 보리를 증류해 만들었지만 1965년 정부가 쌀 부족을 이유로 곡물 주정을 금지해 불가피하게 희석식으로 만들게 된다.
증류식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35도에 이를 정도로 독하다. 독한 소주는 독(毒)도 되고 약(藥)도 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조의 맏아들 이방우가 소주를 과음하다 술병이 나 죽은 반면, 어린 단종이 허약해지자 소주를 먹여 원기를 회복시켰다는 기록도 있다.
요즘 ‘순한 소주’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진로가 참이슬을 17.8도로 낮추자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을 17.5%로 더 내려 맞불을 놨다. 2010년 15.5도짜리 즐겨찾기(진로)가 실패했지만 무학 좋은데이(16.9도)의 돌풍을 계기로 도수낮추기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진 셈이다. 소주회사들에 순한 소주는 그야말로 대박이다. 젊은층이 선호하고, 주정이 덜 들어 1도를 낮출 때마다 원가가 10원가량 절감된다. 17도 미만이면 TV 광고도 가능해진다.
70년대 초까지도 30도였던 소주 도수가 어느덧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쐬주를 캬! 해야 맛이 난다”는 주당들은 섭섭해할 듯하다. 세상은 독해지는데 성인 1인당 연간 98병을 마신다는 소주는 점점 순해지는 아이러니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토요칼럼] 동네 체육센터의 1초컷 신청 마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6897407.3.jpg)

![[취재수첩] 재난 앞에 '오락가락' 국토부, 철저한 조사로 불안 없애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28440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