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소수지분 매각 6% 그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권 매각 유찰 이어 사실상 민영화 실패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매각이 유찰된 데 이어 소수지분(26.97%)도 3분의 1 정도 팔리는 데 그쳤다. 소수지분을 사겠다고 나선 투자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예정가격(최저입찰 기준가격)’보다 낮게 입찰해 인수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지 11월27일자 A1,3면, 12월2일자 A16면 참조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소수지분 23.76%에 대해 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응찰물량이 5.94%라고 4일 밝혔다. 매각대금은 4531억원이다.
낙찰자들은 콜옵션을 받기 때문에 소수지분 주식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인수한 물량의 절반인 2.97%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도 매각되는 소수지분은 최대 8.91%에 그치는 셈이다. 이는 소수지분 예정매각 물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금융위는 다음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매각 관련 모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패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영권 매각은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유효경쟁조차 성립되지 않았고, 소수지분 매각물량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수지분 입찰 직후 신청이 매각 물량보다 1.3배 이상 많다며 기대를 걸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인수전에 불참하면서 우리은행 지분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입찰 막판에 미국 자본 참여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본지 11월27일자 A1,3면, 12월2일자 A16면 참조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소수지분 23.76%에 대해 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응찰물량이 5.94%라고 4일 밝혔다. 매각대금은 4531억원이다.
낙찰자들은 콜옵션을 받기 때문에 소수지분 주식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인수한 물량의 절반인 2.97%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도 매각되는 소수지분은 최대 8.91%에 그치는 셈이다. 이는 소수지분 예정매각 물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금융위는 다음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매각 관련 모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패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영권 매각은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유효경쟁조차 성립되지 않았고, 소수지분 매각물량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수지분 입찰 직후 신청이 매각 물량보다 1.3배 이상 많다며 기대를 걸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인수전에 불참하면서 우리은행 지분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입찰 막판에 미국 자본 참여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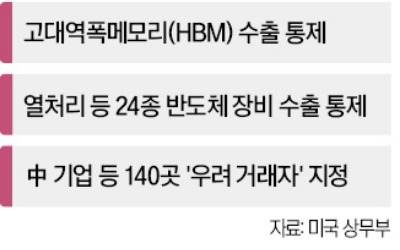
![[포토]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차세대 호위함 사업 청신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3866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