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체들 투자 축소
아시아 원유수출도 중단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새로운 유정개발 승인 건수는 4520건으로 전달인 10월의 7277건에 비해 37.8% 줄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66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시장 반응이다. 로이터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아직 탐사가 시작도 안된 유정이 많지만 유가 하락 탓에 분위기가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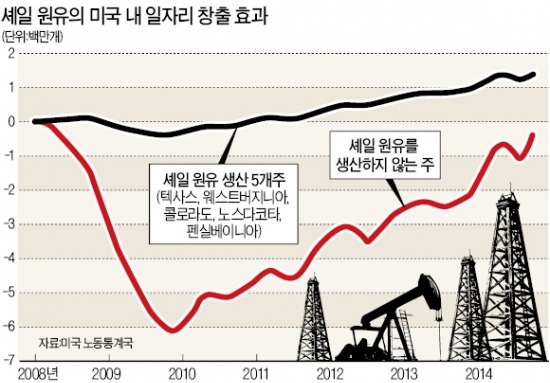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이미 투자 감소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는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20% 줄인 135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회장은 “투자 축소는 현재 경영환경을 감안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가 막바지에 이른 프로젝트는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개발은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유가 급락은 7월 시작된 미국산 원유의 대(對)아시아 수출도 4개월 만에 중단시키면서 미국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아시아지역의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10월 60만배럴에 달했던 아시아지역으로의 미국 원유 수출이 곧바로 타격을 입었다.
셰일 원유 개발붐을 타고 이들 업체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투기등급 채권인 정크본드 시장에서 에너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3%에서 올해 15.4%로 급등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