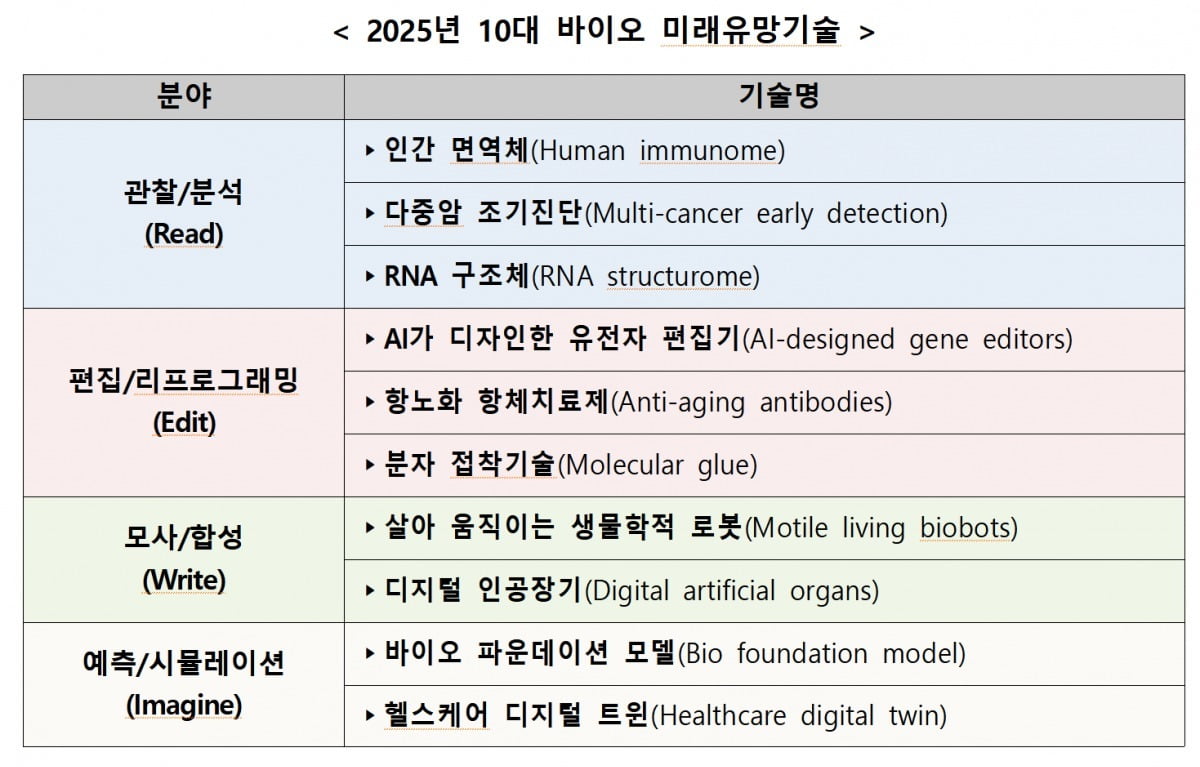[Smart & Mobile] 동영상 서비스 넘어 드라마 제작…넷플릭스, TV시장 흔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파리의 IT이야기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50개국 5300만명이 가입
'하우스 오브 카드' 이어
'마르코 폴로' 자체 제작
드라마 유통방식도 혁신
케이블 TV시장 빠르게 잠식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50개국 5300만명이 가입
'하우스 오브 카드' 이어
'마르코 폴로' 자체 제작
드라마 유통방식도 혁신
케이블 TV시장 빠르게 잠식
![[Smart & Mobile] 동영상 서비스 넘어 드라마 제작…넷플릭스, TV시장 흔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394414.1.jpg)
모두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다. 스마트폰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뿐 아니라 TV 시장도 흔들고 있다. ‘태풍의 눈’은 미국이다. 넷플릭스나 훌루와 같은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비디오 서비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케이블TV 등 기존 방송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TV 시대는 갔다(TV is over)’고 보도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돌풍
특히 넷플릭스가 주목 대상이다. 넷플릭스는 사용 편의성이나 추천 정확도에서 기존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압도한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보다가 노트북에서 이어볼 수도 있다. 자체 제작 영화를 독점 공급하기도 한다. 넷플릭스는 50개 국가에서 5300만명을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다. 수년 내에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는 케이블TV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PwC가 조사했더니 18~24세 연령층의 케이블 가입률은 작년 77%에서 올해 71%로 떨어졌다. 25~34세에서는 페이TV 가입자 중 넷플릭스 가입자 비율이 작년 51%에서 올해 71%로 올랐다. 50~59세 장년층에서도 이 비율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58%로 급등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2일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야심작 ‘마르코 폴로’ 첫 번째 시즌을 내놓았다. 1000억원가량을 투자한 대작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뜨자 과감하게 투자했다. 글로벌 판권도 확보했다. ‘마르코 폴로’가 성공하면 넷플릭스의 글로벌 공략이 탄력을 받고 영화 상영 방식까지 혁신할 수 있다.
○TV도 ‘실시간’과 ‘모바일’이 대세
전통적인 TV 방송의 퇴조는 예고됐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2011년 미국에서 페이TV 가입자가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TV가 주력 미디어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매일 밤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이 쇠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기업 이마케터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다.
미국인은 이제 TV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마케터가 미디어 소비 시간을 조사한 결과 TV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4년 37%(추정)로 떨어졌다. 반면 디지털 미디어 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49%로 급등했다. 요즘엔 TV를 시청하면서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는 시청자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 덕에 특히 ‘모바일 바람’이 거세다. 디지털 미디어를 ‘온라인(유선)’과 ‘모바일(무선)’로 구분하면 온라인은 내림세로 돌아선 반면 모바일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미국인 미디어 소비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에서 2014년 18%로 떨어진 데 비해 모바일 비중은 이 기간에 4%에서 23%로 치솟았다.
![[Smart & Mobile] 동영상 서비스 넘어 드라마 제작…넷플릭스, TV시장 흔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01.9399729.1.jpg)
넷플릭스가 12일 ‘마르코 폴로’를 내놓자 미국 언론에서는 ‘넷플릭스가 케이블 TV 산업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대 20편의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9편을 제작 중이다.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이 성공하면 TV 드라마 유통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TV 방송 시장 빅뱅은 이미 시작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기기의 제약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도 훨씬 수월해졌다. 넷플릭스가 언제 한국 시장에 진출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서비스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국내 방송사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생존을 건 결투가 임박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wang82.hankyung.com

![머스크·베이조스 이어 빌 게이츠도 우주 산업 뛰어들었다 [강경주의 IT카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635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