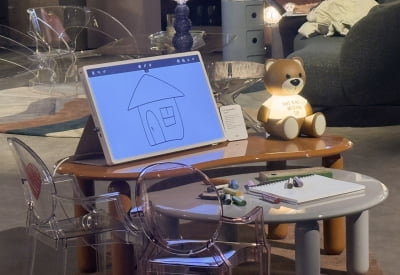이처럼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고 부른다.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18세기 프랑스의 한 주교가 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파괴활동을 반달족의 범죄행위에 빗대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반달족이 들었다면 무척 억울했을 법하다. 사실 그들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였기에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시를 파괴하지 말라’는 로마 교황의 당부에도 순응했다. 후대 역사가들 역시 반달족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체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두 배 큰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사건까지도 반달리즘의 시초라고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에서 약탈과 살인, 공공시설 파괴, 방화 등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사용한다.
용어야 어떻든 이런 훼손행위의 동기는 다양하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동기가 많았다.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서로 상대 지역을 점령하면 건물이나 미술품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21세기에 벌어진 탈레반의 야만적인 행동도 그런 종류다. 비잔티움 제국을 양분시킨 8~9세기 동방정교회의 성상파괴운동도 마찬가지다.
예술품 훼손 사례는 더 많다. 1972년에는 한 헝가리인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미켈란젤로 조각품 ‘피에타’를 망치로 15차례나 내리쳐 성모의 왼팔과 코를 부러뜨렸다. 2000년에는 두 중국인이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전시된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에 오줌을 갈기기도 했다.
엊그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김정은 암살 장면을 담은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북의 테러 위협 때문에 상영되지 못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이젠 반달리즘의 개념이 사이버 무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로까지 넓어졌다. 하긴 인터넷에 올린 악성 비방글이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허위 정보 등을 반달리즘 범주에 넣은 지도 꽤 됐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0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