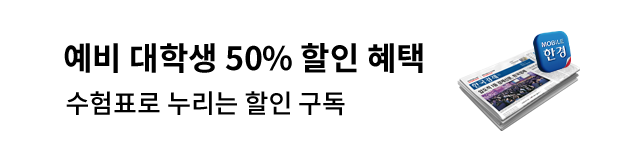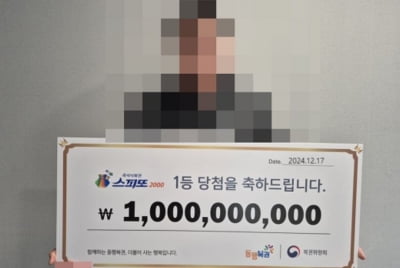언젠가 문득 떠올라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음’이란 메시지가 나왔다. 도메인과 계정 연장을 하지 못해 홈페이지가 없어진 것이다. 그동안 썼던 글과 사람들이 남긴 댓글 등이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셈이다.
○흔적조차 없어진 하이텔, 프리챌, 야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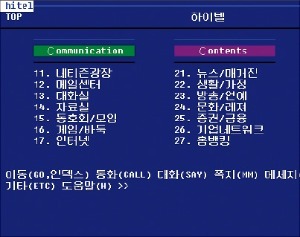
1990년대 PC통신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하이텔의 게임동호회 ‘개오동’과 ‘메탈동(메탈음악 동호회)’이었다. 개오동은 최신 게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게임 제작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게임의 중흥기를 이끈 개발자들을 여럿 배출했고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자로 유명하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역할수행게임(RPG) ‘위저드리’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다. 메탈동에선 당시 얻기 힘든 외국 록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언니네이발관, 델리스파이스 등 한국 인디 음악 1세대로 꼽히는 밴드들이 이곳에서 결성됐다.
하지만 하이텔은 인터넷 보급 이후 쇠락하기 시작했고 2004년 ‘파란닷컴’으로 자리를 옮겨 명맥을 유지했으나 2012년 6월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도 이곳에 쓰여진 글들이 남아 있다면 한국 게임과 음악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터넷 시대로 접어든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1997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야후는 무료 메일 서비스, 검색 등 그때는 생소했던 ‘포털 사이트’를 선보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음, 네이버와 함께 3대 포털로 손꼽혔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고, 결국 2012년 12월 야후코리아 서비스를 종료했다. 블로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한 달 남짓한 자료 백업 기간이 주어졌다.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수년간 쌓은 데이터를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커뮤니티 서비스로 가입자 1000만명을 불러모은 프리챌은 2002년 유료화 정책으로 사용자가 급감했다. 이후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결국 2013년 2월 커뮤니티 서비스를 종료했다. 역시 1개월가량 자료를 백업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커뮤니티의 글과 사진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영원할 수 있을까
사용자들이 자료를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PC통신 ‘나우누리’의 경우 2013년 1월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나우누리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운영업체가 상표와 도메인을 양도하겠다고 하자 주주를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개인의 데이터는 파기되지만 자료 백업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 약관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 이전에 종료를 공지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프리챌 서비스 종료로 자료가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는 네티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프리챌이 이용 약관에 따라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지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엠파스, 라이코스, 한미르, 네띠앙, 다모임 등 수많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직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사용자가 급감해 자료 창고로 전락해버린 곳도 여럿이다.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구글 캘린더나 지메일, 몇 년 전부터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페이스북도 언젠가는 없어질지 모른다. 모두가 영원히 디지털 공간을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 셈이다. 내 기록은 대체 어디에 남겨야 안전할까.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