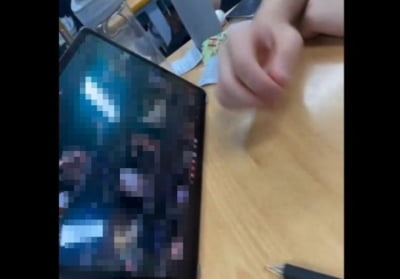살아 있었구나~ 1원·5원짜리 동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유미 기자의 경제 블랙박스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는 주화는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 5원화, 1원화다. 한은은 막 제조된 이들 6개 주화(총 666원)를 ‘주화 세트’로 만들어 기념품으로 판매하거나 외부 선물 등으로 쓴다. 이 가운데 1원·5원화는 주화 세트에 들어갈 용도로만 만들어진다. 거래에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지폐였던 1원·5원화는 1966년 8월16일에 주화로 탄생했다. 무궁화 그림의 1원화는 구리 60%, 아연 40%의 비율로 만들어졌다가 구리 원가가 비싸 1968년 알루미늄 100%로 바뀌었다. 거북선이 그려진 5원화 역시 구리 함량이 88%에서 65%로 낮아졌다.
이때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거스름돈으로 쓰임새가 높았다. 은행 창구에서는 1원 단위로 찍히는 이자를 주화로 따박따박 받았다. 그런데 발행 10년 뒤 ‘한닢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경제성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이 컸다.
예를 들어 1975년에 1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였다. “그림딱지 4.8장. 또는 편지봉투 1장. 고무줄 1개. 껌 4분의 1개. 콩나물 30개(최저거래단위는 30원).”(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1975년 6월19일자)
그보다 앞선 1971년 설 즈음엔 아이들 사이에서 ‘복돈타기 사탕’이 유행했다고 한다. 5원짜리 사탕 박스에서 하나를 잘 뽑으면 1원짜리가 사탕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요행을 바라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한 제과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이후에도 1원을 천으로 싸서 단추로 쓰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5원화도 구박받는 것은 비슷했다. 1977년엔 공중전화 요금이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뛰었다. 시내버스 요금도 10원 단위로 바뀌면서 그나마 있던 쓰임새까지 없어졌다. 1983년 정부는 세금과 공과금 처리에서 끝자리수 1원을 10원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1원·5원화의 비공식적인 사망선고였다.
숫자로는 1원 단위가 일부 남아있다. 일부 병원에선 진료비 등을 수납할 때 1원 단위로 하기도 한다. 물론 실제 결제는 10원 단위로 이뤄진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도 1원 단위는 10원으로 반올림되거나 절삭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치열한 가격경쟁 탓에 ‘1원 낙찰’이 벌어지기도 한다. 악의를 품은 소비자(블랙컨슈머)가 은행에서 “1만21원을 찾았는데 왜 1만30원을 주나. 1원을 내놓아라”고 따질 때도 1원은 필요하다. 그런다고 1원·5원화의 쓰임새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원·5원화의 발행잔액(발행액-환수액)은 약 16억4000만원이다. 2003년 이후 변함이 없다. 과거 풀렸던 돈이 어디론가 남아서 은행 창구나 한은으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돼지저금통을 더 이상 자주 볼 수 없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1988년 24.7%에 달했던 가계저축률은 4%대로 바닥 수준이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1990년대까지는 저금통에 모은 주화를 지폐와 바꾸거나 입금하려고 많이 가져왔다”며 “현재 5원·10원화는 가정에서 분실했거나 화폐수집상 등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거래 용도로 잘 쓰이지 않을 뿐 1원·5원화는 여전히 법적 화폐”라고 강조했다. 옷장 서랍에서 1원짜리를 10개 발견했다면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10원으로 바꿔갈 수 있다. 혹은 천으로 싸서 단추로 쓰거나.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