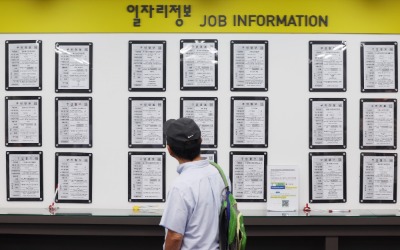일상 속 소중한 것부터 챙겨보길
이석현 < 국회 부의장 esh337@hanmail.net >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은 살아 계셨을 때 일기에서 아들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젖어 넋을 놓고 며칠을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토가 나오도록 싫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 먼저 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밥조차도 먹는 게 부끄러웠던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어릴 적 넘어져서 다칠 때나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에서 힘들어할 때 어머니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밥은 밥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들 대신 삼키는 눈물이고 아들과 함께 나누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새해가 시작됐다.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레 떠오르며 서서히 빛을 발하는 태양에서 어머니의 품을 느낀다. 그리고 서해로 질 때에도 태양은 밤늦게 곤히 자는 자식에게 이불을 덮어주듯이 포근하다.
연말연휴에 다소 어수선했던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첫주가 시작됐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작심삼일도 자주 하면 결국 목표한 바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루지도 못할 거창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놓치고 있다.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부모님의 삶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애써 믿지 않으려는 듯 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는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매주 첫날 아침 출근길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전화 드리는 시간으로 스마트 폰에 알람을 설정해두자고. 2015년에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는 연말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석현 < 국회 부의장 esh337@hanmail.net >


![[토요칼럼] 딥테크 시대, 기초과학 강국 일본과 협력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34201788.3.jpg)

![[취재수첩] 트럼프 2기 탄소포집 시장 오히려 커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25714224.3.jpg)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