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첫 공연은 이런 점에서 낙제점에 가까웠다. 원작은 비비안 리 주연의 고전 영화로 유명한 마거릿 미첼의 동명 소설이다. 미국 남북전쟁 속에서 대지주의 딸 스칼렛 오하라의 파란만장한 운명과 사랑을 그린다. 프랑스에서 2003년 만들어 초연한 뮤지컬을 국내 제작진이 무대화했다.
공연은 영화의 하이라이트 편집본 같다. 무대 언어를 활용한 이야기 구조로 치밀하게 재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순으로 내용을 이어간다. 시작과 끝에 흐르는 영화 주제곡 ‘타라의 테마’와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의상과 이미지도 그런 느낌을 강화시킨다. 주·조연들의 설익은 연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특유의 감성과 무대 미학으로 재탄생한 고전을 기대했다면 낭패감이 들 법하다.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는 ‘녹음된 음악(MR)’ 사용과 장면 전환 사이 삽입되는 춤사위 정도만이 작품의 출생지를 짐작하게 한다.
극중 몰입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은 ‘음향의 부조화’다. 오페라를 주로 상연하는 공연장과 MR의 궁합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감안해도 좀 심하다. MR은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대에서 실연되는 가창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여럿이 부르는 합창에선 여지없이 윙윙거리고, 서정적인 솔로곡에선 배우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따로 논다. 소리가 좋지 않고, 가사도 들리지 않는다. 커튼콜 앙코르 무대에선 작심하고 볼륨을 최대치로 올린 듯했다. 굉음 수준이다. 감성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슴을 울린다. ‘좋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를 들려주고, 음향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공연에서 관객이 가장 피해야 할 좌석은 무대 양쪽 대형 스피커와 가까운 자리다. 엄청난 음량에 시달리기에 십상이어서다. 내달 15일까지, 5만~14만원.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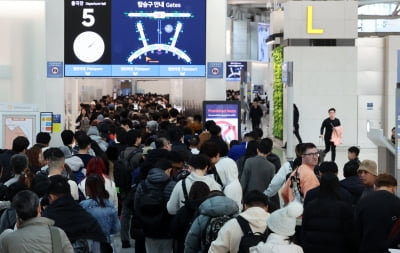
!['오겜2' 독주 꺾고 1위 등극…"한국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61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