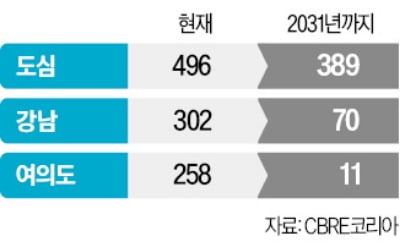ICT 등 유관 산업과 융복합 강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참여 늘려야"
조만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국내 부동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첫째, 중개업·개발업·관리업·감정평가업의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야 경쟁력 있는 종합부동산서비스 업체가 출현할 수 있다. 각 업역에서 법인 설립시 각각 전문자격사만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 법인의 업무영역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되는 업무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 법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기존의 개인 중심 업체를 최대한 수용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업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윈윈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업역 간 칸막이가 없는 일본 부동산업체 중 이에블, 레오팔레스21, 다이토겐타쿠 등은 중개업 또는 건설업에서 출발해 업역 간 수직적 통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부동산업체로 성장했다. 반면 작년 한 해 거래된 대형(프라임급) 업무용 빌딩 7개 중 5개(거래대금 총 1조8600억원)를 외국자본이 매입했을 정도로 국제화된 서울의 대형 업무용 빌딩 시장에선 중개·실사·법인설립·감정평가·관리 등의 서비스를 외국계 종합부동산서비스 업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서비스업과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기술(ICT) 등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 벤처업체가 많이 설립돼 활발하게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질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급성장해 2011년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쟁사인 트룰리아를 35억달러(약 3조5885억원)에 인수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벤처투자업종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개발·운영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금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주식·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2년 말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33조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연간 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해외 대체투자는 국내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투자 및 파생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1경원에 달하는 한국 전체 국부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며,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에서도 다양한 투자물건을 발굴할 수 있다. 런던·뉴욕·시드니 같은 외국 대도시를 비롯해 중국·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틈새시장의 우량 부동산 물건을 확보해 관리·운영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부동산기업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조만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