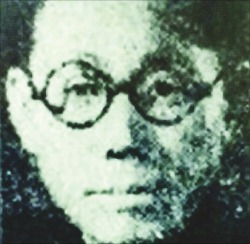
이에 오랫동안 이용악을 연구해 온 곽효환 시인(대산문화재단 상무), 이경수 문학평론가(중앙대 국문과 교수), 이현승 시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용악 전집(소명출판)을 펴냈다. 책은 이용악이 남긴 시집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발표한 시 전편과 산문집 ‘보람찬 청춘’, 좌담 자료까지 망라한다.

이용악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이어진 일제의 수탈과 이로 인해 고통받고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는 자신의 시에 ‘북방’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해 ‘북방의 시인’으로 불린다. 이 비극적 현실을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기에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오랑캐꽃’ ‘그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꽃가루 속에’ ‘달 있는 제사’ 등을 읽으면 그가 서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탁월한 재능을 지닌 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집엔 6·25전쟁 중 월북해 북한에서 남긴 작품도 충실히 실려 있다.
1940년대 들어 사회주의자가 된 그는 남조선노동당 출신으로 북한에 정착해 체제에 협력했다. 곽 시인은 “이용악은 해방 이전에는 민족 수난과 고통을 보여줬다”며 “월북 후 그의 작품에선 북한 문예이론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악은 1930~1940년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그렸으며 지금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시인이다. 998쪽, 5만9000원.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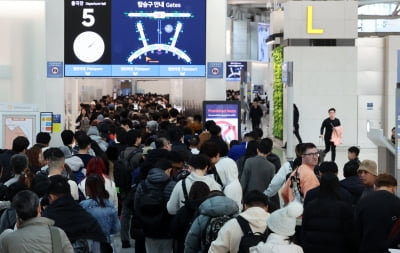
!['오겜2' 독주 꺾고 1위 등극…"한국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61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