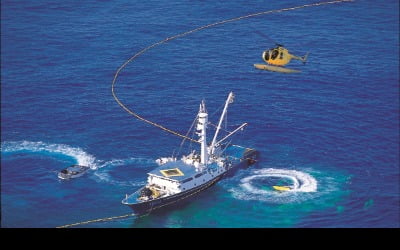[월요인터뷰] 김기문 "많은 기업에 혜택 주는 中企정책, 선별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말 물러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목소리 큰 이익집단 위한 정책 내놓는 행태 문제
혜택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기업 골라 집중 지원해야
개성공단, 통일비용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창업은 충분히 준비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 있어야
목소리 큰 이익집단 위한 정책 내놓는 행태 문제
혜택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기업 골라 집중 지원해야
개성공단, 통일비용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창업은 충분히 준비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 있어야

김 회장은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크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가 작으면 필요해도 만들지 않는 것 같아 회의적일 때도 있었다”며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년간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식의 얘기를 싫어합니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현실적인 일에 집중했습니다. 홈쇼핑 진출, 중소기업DMC타워 건설, 노란우산공제회 확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약을 다 지키고, 그보다 더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는 공약은 어떻습니까.
“과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뭐라고 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나 국회 정부 모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지요. 지난 정부 때 일인데, 실업률이 높다고 외국인 인력 활용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 ‘외국인이 일하는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외국인을 안 쓰면 공장이 안 돌아가 내국인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외국인 쿼터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필요한 얘기를 정부에 해서 정확한 정책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다양하고, 똑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기 힘드니까 계속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효성 면에서는 혜택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도 늘리고, 국가도 이익이고, 기업도 이익인 방안이죠.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크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가 작으면 필요해도 만들지 않는 것 같아 회의적일 때도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 놓고 사문화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책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품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것처럼 정책도 계속 손을 봐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업승계 세금공제 제도가 1억원에서 출발해 500억원까지 간 것처럼 말이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월요인터뷰] 김기문 "많은 기업에 혜택 주는 中企정책, 선별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607555.1.jpg)
▷중소기업에서도 2, 3세 승계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업을 넘겨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승계 결정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기업이 망하고, 창업자에게도 손해입니다.”
▷승계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업 세대들은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죽기살기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정서를 알고 있어요. 2, 3세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업무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면 총감독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직원들로부터 스스로 인정받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너의 자식이라고 인정받길 바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도 하게 해야 합니다. 물류기지에 가서 물건도 옮겨보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며 소비자 불만도 직접 겪어봐야 합니다. 월급쟁이로서 시간을 가져야 직원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부딪쳐야 소비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계승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를 북한 곳곳에 만드는 게 통일을 앞당길 수는 없어도 통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떡도 받게 해주면 명분 없이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꼽는다면.
“신뢰입니다. 오래전 친척 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린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 것이었지요. 가만 있으면 안 갚아도 되는데 팔아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정성이 뻗쳤다며 뭐라 했지만 나중에 그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내가 시계를 만들어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현금으로 사줬어요. 부도 내고 돈 빼돌린 사람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해줄 얘기는.
“미국 GM이나 일본 소니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게 힘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이걸 해놓으면 저게 문제고, 그래서 계속 개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쾌감을 느끼고, 성공하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다만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도전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 김기문 회장은…
김기문 회장은 1955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농업고를 졸업했다. 시계회사에서 영업하다 1988년 4월 로만손을 창업해 매출 15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2006년부터 초대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을 맡아 공단이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상대편 후보를 지원한 중앙회 임직원들을 요직에 발탁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수완을 보였다. 중앙회 회원사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이사장을 대거 교체해 회원사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취임 때 7만개를 밑돌던 회원사는 지금 91만개를 넘었다. 지난 총선 때는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정도로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받는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자선사업가'가 어떻게 29억 슈퍼카를 타냐…비난 쏟아졌다 [박의명의 K-인더스트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8166.3.gif)
!["500층 앞두고 와르르"…테슬라 '쇼크'에 서학개미 '눈물'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83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