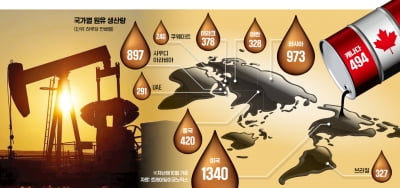설 앞두고 분주한 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삼천리이앤이
하루 1000만장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공장' 이름 날렸는데
소비 줄며 이젠 20만장 불과
환경악화 주범 몰려 문닫을 판…공장 지방이전도 어려워 '한숨'

서울 도심의 마지막 남은 연탄공장인 삼천리이앤이 연탄공장은 1950년대 후반 경기 시흥시에 세워졌고 1967년 이곳으로 옮겨왔다. 1970년대만 해도 하루 1000만장을 생산하면서 아시아 최대 연탄 생산기지로 이름을 날렸다. 1990년대 들어 연탄 소비가 줄면서 최근 생산하는 연탄은 하루 20만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수요는 여전하다. 설 연휴를 앞둔 이맘때가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장 안에는 연탄을 만들기 위한 석탄가루가 15m가량 쌓여 있었다. 석탄가루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석탄에서 나오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석탄가루에 적당한 수분이 배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연탄 모양을 찍어낼 수 있다.
연탄 찍는 기계에 들어간 석탄가루는 40m가량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에 줄줄이 연탄으로 실려 나왔다. 벨트 옆에선 상인들이 각자 몰고 온 봉고트럭을 가까이 붙여대고 연탄을 옮겨 실었다. 상인 혼자 힘으로 벅차다 보니 회사 직원 세 명이 연탄 싣는 것을 도와줬다. 연탄 하나의 무게는 최소 3.6㎏. 한 번에 네 개씩 들으면 15㎏에 달하는 적지 않은 무게다. 환갑을 넘긴 이대용 씨는 “하루에 3만개를 싣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7500번 허리를 굽혔다 펴야 하는 중노동”이라며 “설 연휴를 앞둔 성수기에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성수기엔 하루 27 규모 덤프트럭 20대가 공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후 4시쯤엔 공장을 찾는 트럭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공장 직원들은 여전히 연탄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밤늦게 공장을 찾는 상인들을 위해 수백개의 연탄을 미리 쌓아놔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연탄공장 명맥을 이어오던 이문동 공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건강상의 피해와 주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지역 주민 민원이 수년간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이문동 연탄공장 이전’을 공약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경기 지역으로 연탄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두용 삼천리이앤이 전무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분진이 거의 나오지 않아 환경 피해는 전혀 없다”며 “환경단체들도 검사 명목으로 공장에 많이 와봤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얼굴이 내란, 살이나 빼"…양극화 부추기는 '혐오' 선 넘었다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68938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