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전통시장 살리는 지름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창동 유통전문기자·경제학博 cdkang@hankyung.com
![[전문기자 칼럼] 전통시장 살리는 지름길](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639722.1.jpg)
막무가내식 규제 입법
한국에선 정치인만큼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장소로 그만인 까닭이다. 이들이 내놓는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은 항상 ‘대기업 발 묶기’로 귀결된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가까운 곳에 대형 소매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단골 메뉴다.
이 같은 ‘네거티브 처방’의 약효는 이미 밑천이 드러났다. 2002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3년까지 정부는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정치권은 규제입법으로 지원사격을 해댔지만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01년 40조1000억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정치권은 올 들어 또다시 입법의 칼을 휘두를 태세다.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 330㎡ 이상~3000㎡ 미만 슈퍼마켓도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개설할 경우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회생의 관건은 상인 혁신
전통시장 매출이 반토막 난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려면 혁신을 통해 끌어올린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시장은 그대로인데 대기업 발목을 잡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상인들의 고령화다. 전통시장 상인 33만4400여명의 평균 연령이 55세다. 이 중 60대 이상이 33%에 달한다. 젊고 활기찬 곳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심리다. 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쇼핑 장소는 더더욱 그렇다.
전통시장이야말로 젊은 피 수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전통시장에서 삶의 터전을 삼겠다는 청년상인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늙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입하는 일이 대기업 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전주남부시장에서 시작된 청년상인 운동이다. 그해 9개 점포로 시작한 청년몰은 최근 40개로 늘어났다. 이들이 주도하는 주말 야시장에는 1만명 가까운 손님들이 몰려든다. 60대 이상 고령 상인들이 멍하니 점포를 지키던 4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붕과 바닥만 바꿀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경제학博 cdka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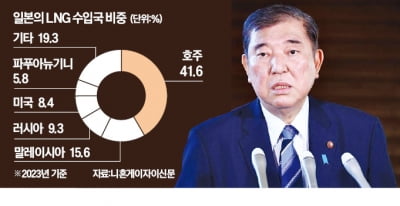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