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성취 쌓으며 자존감 높이 세워
잠재력의 활화산 폭발할 수 있다면"
우종민 < '티모스 실종사건 저자'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 jongmin.woo@gmail.com >

만연한 분노의 원천은 채워지지 못한 ‘인정 욕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욕망, 이성(로고스), 티모스(thymos)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개’나 ‘용기’로 번역되기도 하는 티모스는 ‘정당한 인정’ ‘도덕적 인정’을 뜻한다. 잘은 몰라도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그럭저럭 괜찮다는 자기 긍정이 플라톤이 말한 도덕적 인정이다.
다윗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고, 세종대왕은 왜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반포했을까. 또 이순신 장군이 전쟁 막판에 위험을 무릅쓰고 노량해협에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성적으로 보면 돌을 던져 위험을 부르지 말고, 그냥 중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도망가는 적군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전리품이나 챙기면 됐을 일이다. 하지만 다윗이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게는 욕망과 이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실존의 가치를 좌우하는 뜨거운 그 무엇이 있었다. 바로 티모스다.
티모스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가슴 한복판, 양쪽 갈비뼈 사이에 약 30g의 흉선(胸線·thymus)이 있다. 그리스어 티모스와 어원이 같은 면역기관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적과 싸우며 종족을 지키려는 정당한 분노를 티모스라고 불렀다. 이후 현대 의학자들은 가슴속에 존재하는 이 작은 면역기관이 외부 공격에 맞서 생존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는 뜻에서 티모스라 명명했다. 이렇듯 티모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지키려는 힘, 삶에 대한 열정, 용기를 지칭한다.
그럼 어떻게 티모스를 찾아 깨울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티모스가 가장 활발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어떤 열망으로 가슴이 뛰었던 경험, 좌절을 딛고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이뤘던 경험, 남에게 제대로 인정받고 자존심도 지켜냈던 경험들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 뇌는 잠시 문이 열리고 티모스가 되살아난다. 이 순간이 바로 1973년 노벨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 박사가 말한 ‘결정적 순간’이다. 우리는 티모스가 가장 활발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결정적 순간의 기억을 뇌에 각인시켜야 한다.
둘째, 작은 성취의 연속이 중요하다. 홈런보다 3연타석 안타가 낫다. 안타를 계속 쳐야 성취감의 상승 곡선을 유지할 수 있다. 자꾸 삼진 당하면 자존감이 하락한다. 티모스를 가동시키는 연료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다. ‘한 달에 한 번씩 요리하기’, ‘팔굽혀펴기 한 개씩 늘리기’ 등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작지만 성과를 냈으면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셋째, 다른 사람의 티모스를 봐줘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남의 인정욕구를 파악하고 이것을 채워줘야 한다.
티모스는 열정의 발전소이자 잠재력의 원천이다. 가슴속에 잠자고 있는 티모스를 자극해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삶을 되찾자. 티모스를 되찾은 조직원들로 구성된 기업은 열정에 불타는 전사들로 가득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조직은 당연히 성공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종민 < ‘티모스 실종사건 저자’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 jongmin.woo@gmail.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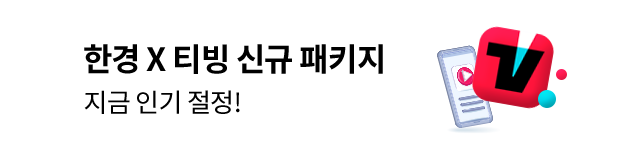
![[한경에세이] "나도 레모네이드 팔 거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10855.3.jpg)
![[토요칼럼] AI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540074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