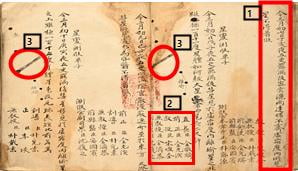"분쟁지역 어린이 보호는 세계평화를 위한 전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ICC·유니세프 정신은 '박애'
아이들 세계엔 인종·국가 없는데
소년병·미혼모로 만든 건 어른들
ICC·유니세프 정신은 '박애'
아이들 세계엔 인종·국가 없는데
소년병·미혼모로 만든 건 어른들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74)은 최근 서울 청운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국제 어린이 구호활동의 성격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생각과는 달리 송 회장의 답변은 단호했다. 그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 단원들이 분쟁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수많은 어린이가 희생돼 너무나 안타깝고, 유니세프에서도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6년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맡았다. 그는 “ICC에 전쟁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혜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부녀자”라며 “ICC와 유니세프는 박애정신을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직에 대해선 “명예직 성격이 강하고 본부로부터 1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별 권한은 없다”면서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아동인권 개념 확립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임기 2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송 회장은 ICC 소장 시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소년병과 아동 노동자, 미성년 미혼모들과 마주했다. 송 회장은 “내전 지역에서 반군 총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비행기 추락사고를 겪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8세짜리 남자아이가 소년병으로 끌려가 마약에 취해 자기 키보다 더 큰 총을 쏘고 다니며 ‘인간 병기’가 되고, 12세 소녀가 성노예로 끌려가 아이를 출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세계엔 인종도, 국가도 없는데 그들을 이런 현실로 내몬 건 어른들”이라며 “아동 인권 보호는 곧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이 유니세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인 1993년이다. “부부가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자신은 유니세프에, 부인은 대한적십자회에서 기부활동을 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원을 위한 법률가 클럽도 조직했다. 그러다가 2012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이 됐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유니세프에 대해 ‘국내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왜 신경써야 하느냐’는 반발도 많았지만 요즘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한국은 지난해 유니세프 회원국 중 모금액 4위”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 일부 자선단체의 비리와 주먹구구식 체계 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 회장은 “국내 일각에서 자선활동을 마치 개인 영리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자선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선활동을 할 땐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치적 진영논리의 진입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자선 단체들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