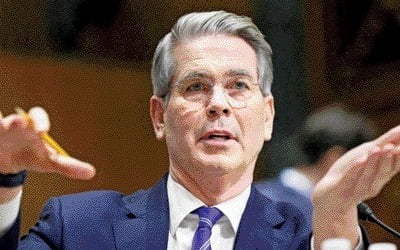[한·일수교 50주년-한국 속의 일본기업] 구미서 2000명 고용한 도레이첨단소재…매출 연 11% 성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원에서 상생으로
1972년 삼성에 기술 지원…옛 제일합섬 지분 첫 투자
1999년 옛 새한과 합작법인
탄소섬유 기술 유출 우려에도 구미에 생산공장 잇단 설립
각국과 FTA 체결한 한국, 일본 기업에 투자 매력
삼성·현대차 등 납품처 갖춰
1972년 삼성에 기술 지원…옛 제일합섬 지분 첫 투자
1999년 옛 새한과 합작법인
탄소섬유 기술 유출 우려에도 구미에 생산공장 잇단 설립
각국과 FTA 체결한 한국, 일본 기업에 투자 매력
삼성·현대차 등 납품처 갖춰

조 사장의 지적처럼 재계에서는 일본의 간판 기업인 도레이의 한국 투자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 중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는다. 도레이는 1999년 옛 (주)새한과 합작으로 도레이새한을 설립했다. 이후 새한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로 이름을 바꿨다. 도레이첨단소재의 매출은 2000년 4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1889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이 회사가 구미에서 고용한 인원은 같은 기간 416명에서 1941명으로 4.6배 늘었다.
구미시 살리는 도레이
![[한·일수교 50주년-한국 속의 일본기업] 구미서 2000명 고용한 도레이첨단소재…매출 연 11% 성장](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AA.10125207.1.jpg)
도레이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 2200t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구미 3공장을 2013년 지었다. 이후 생산 규모를 2500t으로 늘리는 증설을 지난 4월 완료했다. 도레이가 일본 이외 국가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건설한 것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다.
도레이는 지금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구미 3공장 등 도레이첨단소재 공장 3개와 도레이BSF, 도레이케미칼의 공장 3개 등 모두 6개 공장을 구미시에 지었다. 고용인원(1941명)은 구미시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세 번째다.
구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2012~2014년 3년간 연평균 54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지난해 구미시의 지방세 수입(총 3400억원)의 1.5% 수준이다. “살림살이도 살림살이지만 지역 산업구조의 축을 탄소섬유, 수(水)처리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레이첨단소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게 황종철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의 설명이다.

도레이가 한국에 처음 투자한 때는 1972년이다. 삼성그룹이 옛 제일합섬을 설립할 때 지분 34%를 취득했다. 김은주 도레이첨단소재 상무는 “당시엔 사업 파트너였던 삼성에 대한 기술 전수의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의 강점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 사장은 “한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이 있고 인력과 정부 지원 등도 우수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일본 기업이 느끼는 한국 시장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삼성·현대차그룹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존재다.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제조사인 일본 TOK첨단재료는 2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연구·생산시설을 2013년 준공했다. 세계 인공조미료(MSG) 1위 기업인 일본 아지노모토도 송도에 357억원을 투자해 세포배양배지(세포 배양에 필요한 영양소를 혼합한 물질) 생산시설을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이들은 각각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둘째는 한국이 여러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스미토모화학은 800억여원을 투자해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분리막 공장을 한국에 2017년까지 짓기로 했다. 테슬라 등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스미토모화학의 분석이다.
일본의 스낵업계 1위 기업인 가루비도 해태제과와 함께 총 360억여원을 들여 한국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한·미 FTA로 미국산 감자를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투자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한·일 외교관계 악화, 엔저(低), 한국 대기업의 성장세 둔화 등 요인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1분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억8900만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61.3% 감소했다. 송성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센터장은 “엔저가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납품을 겨냥한 한국 대기업 투자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송종현/김순신 기자 scream@hankyung.com
![[르포] 폐지를 새종이로.. 친환경으로 프린터 판도 바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26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