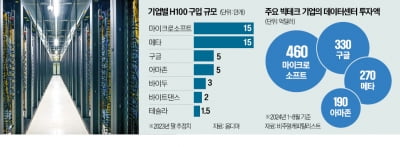올해 삼성페이·페이코 등 6개 서비스 등장
10월께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도 출시
2017년 721조 시장 전망…"보안 불안" 지적도

올해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만 6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연 삼성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6엣지플러스 공개 행사에서 함께 선보인 ‘삼성페이’를 국내 시장에 이달 20일 출시한다. 미국에서는 다음달 28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페이는 신용카드를 카드 결제기에 긁는 대신 스마트폰에서 카드 결제기로 암호화된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카드 결제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네이버(옛 NHN)에서 떨어져 나온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페이코’를 내놨다. 현재 게임 부문이 주력인 NHN엔터테인먼트는 페이코 출시를 계기로 종합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페이코의 온라인 가맹점은 10여만개로 KG이니시스 ‘케이페이’, LG유플러스 ‘페이나우’ 등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와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3일 나란히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페이나우’를 업그레이드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터치 한 번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나우 터치’를 출시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일반 유통업체로는 처음 모바일 통합결제 시스템인 ‘SSG페이’를 선보였다. 이 밖에 네이버의 ‘네이버페이’(6월), SK플래닛의 ‘시럽페이’(4월), 티켓몬스터의 ‘티몬페이’(3월) 등 올 들어 등장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만 6개에 달한다.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경쟁
구글은 10월께 새로운 스마트폰 넥서스 시리즈 2종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LG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유력하다. 넥서스폰에는 구글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안드로이드 페이’가 탑재될 전망이다. 경쟁 서비스인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다소 늦었지만 60%가 넘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최대 무기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지난달 영국에 25만개 가맹점을 확보하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올해 중국과 캐나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이폰6 시리즈 사용자의 42%가 애플페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쇼핑 업체인 알리바바가 2004년 첫선을 보인 알리페이는 현재 3억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간편결제의 원조 격인 미국 페이팔(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전자지갑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도 쑥쑥…2017년 721조원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매년 30~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7년에는 시장 규모가 72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1조127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모바일 결제 규모는 지난 2분기 5조7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데다 온라인 쇼핑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43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조9780억원으로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의 44.6%를 차지했다. 모바일 쇼핑 통계가 나온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안 불안감 해소 등 과제도
대다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유효기간,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한 뒤 휴대폰으로 인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번거롭게 여기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알리페이나 미국의 페이팔의 결제 사고율은 0.3%에서 최대 1% 정도다. 국내 카드사의 사고율이 0.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간편결제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범용성 및 보안 등에서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