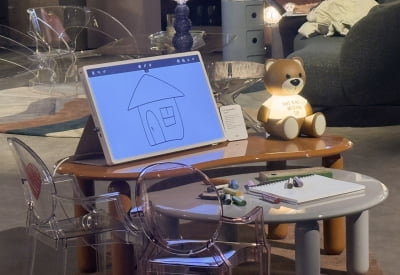조이 제독은 이런 식으로 치른 ‘총성 없는 전쟁’의 전말을 세세히 기록했다. 그게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How Communists Negotiate)?라는 책이다. 그는 첫 장에 “공산주의자들은 엉겁결에 회의에 참여하거나 황급하게 협상에 들어가는 일이 없으며, 주의 깊게 무대를 설정한다”고 썼다. 회담이 북측 점령지 개성에서 열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의제 설정도 그렇다. 유엔 측이 동서 횡단 비무장지대 설치를 의제로 내걸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측이 점령한 38선 이북의 땅이 훨씬 많았기에 이런 주장을 던져놓고 하나씩 흥정하는 방식이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지연전술을 병행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합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상대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무언가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상대의 조급성을 역이용해 큰 이득을 보려 한다.” 노벨평화상에 목말라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급증을 지렛대 삼아 거액의 달러와 6·15선언을 받아낸 것, 임기 중 북핵 문제라도 해결해보려 안달하는 부시 행정부에 9·19합의를 얻어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뒤 돌려준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이었다.
조이는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들의 행동만 믿어라”고 조언한다. 그들이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라는 것이다. 레닌이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 방법”이라고 말한 걸 떠올리게 한다. 김일성도 “대화건 협상이건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공격 형태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보다 세력이 약할 때, 시간을 벌고자 할 때, 원조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때만 악수를 청한다. 나흘에 걸친 이번 접촉에서도 그랬다. 우리가 얻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고, 내준 것은 젊은 병사들의 발목과 확성기방송 철회였으니, 이래저래 또 말려든 것 같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0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