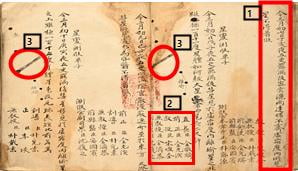[노동개혁 첩첩산중] 정부 강공 나섰지만…노사정 여전히 지지부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 강력 반발…협상전략 논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협상이 늦어진 까닭은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노사정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이 한창 협상 중일 때 논의 테이블 바깥에서 협상 당사자들을 지나치게 압박해 오히려 대타협 분위기를 흐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입법 절차와 예산 반영을 이유로 대타협 논의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0일 노·사·정 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됐다. 오전 11시에 모인 대표자들이 오후 3시께 합의문 조정 문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진전이었다. 다소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대표자들은 자정 무렵 회의를 마치고 12일 회의에서 결론을 보기로 했다. 1년여를 끌어온 노동개혁 협상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종료 5분 뒤 정부는 11일 오전 8시30분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장관이 노동개혁 독자 추진 내용을 알리는 합동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노동계는 “협상 중에 일방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노사정위도 격앙했다. 마치 10일이 노사정위가 정해놓은 시간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불만이던 터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협상 시한이라고 정해놓은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기재부 장관이 자꾸 시한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정부 대표도 아니고,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미숙한 협상전략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타협 무산 때도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가 요구할 카드를 기재부 등에서 미리 제시했다. 김 위원장도 “협상 중에 우리가 할 얘기를 정부가 생색내듯 다 써버린 것도 대타협 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행동을 보면 마치 대타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가 입법 절차와 예산 반영을 이유로 대타협 논의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0일 노·사·정 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됐다. 오전 11시에 모인 대표자들이 오후 3시께 합의문 조정 문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진전이었다. 다소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대표자들은 자정 무렵 회의를 마치고 12일 회의에서 결론을 보기로 했다. 1년여를 끌어온 노동개혁 협상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종료 5분 뒤 정부는 11일 오전 8시30분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장관이 노동개혁 독자 추진 내용을 알리는 합동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노동계는 “협상 중에 일방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노사정위도 격앙했다. 마치 10일이 노사정위가 정해놓은 시간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불만이던 터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협상 시한이라고 정해놓은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기재부 장관이 자꾸 시한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정부 대표도 아니고,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미숙한 협상전략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타협 무산 때도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가 요구할 카드를 기재부 등에서 미리 제시했다. 김 위원장도 “협상 중에 우리가 할 얘기를 정부가 생색내듯 다 써버린 것도 대타협 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행동을 보면 마치 대타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