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6·25전쟁 전사경찰관 11명, 가족 품에서 65년 만에 잠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신이 영웅입니다 - 경찰청·한국경제신문 공동기획
국립서울현충원서 합동안장식
"남침 막기 위해 전투 중 숨져…애국심 강한 아버지 잊지 못해"
국립서울현충원서 합동안장식
"남침 막기 위해 전투 중 숨져…애국심 강한 아버지 잊지 못해"
![[경찰팀 리포트] 6·25전쟁 전사경찰관 11명, 가족 품에서 65년 만에 잠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AA.10785985.1.jpg)
지난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유해발굴사업으로 신원이 확인된 6·25전쟁 전사 경찰관 11명의 합동안장식(사진)이 열렸다.
전남 영광 학동마을 교전에서 전사한 손봉석 경사의 딸 손원애 씨(67)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버지를 현충원에 모시게 돼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다”며 “임종 직전까지 아버지 유해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1920년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서 태어난 손 경사는 1950년 7월 전주를 장악한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다 숨졌다. 그의 나이 서른하나로 당시 손씨는 두 살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손씨는 어머니와 9년 정도 살다가 친할머니 손에 자랐다. 손씨는 “너무 어릴 때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며 “어른들은 아버지를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경찰로 기억했다”고 전했다. 그는 “열여덟 살 결혼하던 때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강원 군자리 전투에서 숨진 김세한 경사의 딸 김준자 씨(66)는 “내가 돌도 안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허전했는데 이제라도 찾게 돼 여한이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경사의 유해는 2013년 12월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김씨가 김 경사의 유해를 어루만지며 흐느끼는 모습에 주위 사람의 눈시울까지 붉어졌다는 게 가족들의 말이다.
6·25전쟁 개전 나흘째인 1950년 6월29일 전사한 김 경사는 강원 춘천시 군자리 일대에서 북한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숨졌다. 김씨는 “경찰 제복 단추, 벨트 버클, 숟가락이 유해와 함께 발견됐다”며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복을 입은 채로 전투 현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외사촌들까지 경찰이었다”며 “아버지는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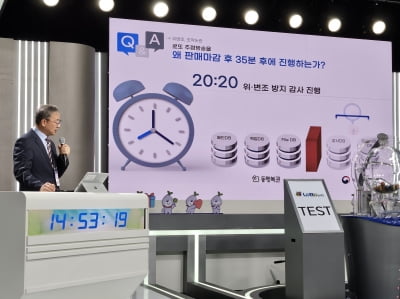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