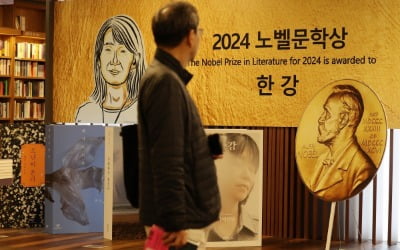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인 원숭이는 만능 재주꾼인 데다 부모·자식 간, 부부지간의 사랑이 사람 못지않게 극진하다고 한다. 새끼를 잃은 슬픔에 어미 원숭이의 창자(애)가 끊어졌다는 단장(斷腸)의 슬픔은 중국 남북조시대 고사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그만큼 원숭이는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였다. 청자모자상, 청자원형연적 등의 도자기에도 어미가 새끼를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우리 민족에 비친 원숭이의 대체적인 모습은 꾀 많고 재주 있고 흉내 잘 내는 장난꾸러기다. 원숭이는 한반도에는 없는 동물이지만 여러 민속과 전통미술품에 자주 등장한다. 자기나 회화에서 원숭이가 스님의 시중을 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불교 설화나 서유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는 모습은 장수(長壽)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옛 그림이나 문방사우에서도 원숭이가 자주 등장한다. 원숭이 후()는 제후 후(侯)의 발음과 같아 원숭이는 높은 벼슬의 상징이었다.
민속에 나타난 원숭이 이야기는 생김새나 흉내 내기, 재주, 꾀 등을 소재 삼아 그 재주의 과신이나 잔꾀를 경계하는 것이 많다. 탈판에서는 사람 흉내를 적나라하게 내는 원숭이를 통해 신발값을 받으려 하지만 결국 받지 못하는 신발장수의 비행을 풍자와 해학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스님을 도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왔다는 전설 덕에 여러 희곡과 소설에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잔재주만 부린다고 생각했던 원숭이는 건강, 성공, 수호의 힘을 가진 용감한 존재로 인식됐다. 속신에서는 원숭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큰 건물이나 사찰을 세울 때 원숭이를 새겼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