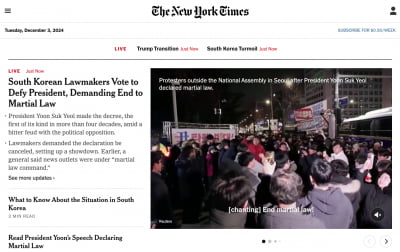[다산칼럼] 알맹이도 균형도 없는 공약(空約)은 재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부채는 아랑곳 않는 공약더미
우리 기업만 쪼그라뜨리는 자충수
경제발전 앞서 이끌 후보 가려내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
우리 기업만 쪼그라뜨리는 자충수
경제발전 앞서 이끌 후보 가려내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
![[다산칼럼] 알맹이도 균형도 없는 공약(空約)은 재앙](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02.6934340.1.jpg)
민주당 예비후보 TV 토론에서 하트가 복지 공약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먼데일이 알맹이 없음을 꼬집으며 “Where’s the beef?”로 공격했다. 당황한 하트는 말을 더듬었고 방청석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먼데일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 TV 토론에서 레이건의 순발력이 발휘됐다. 먼데일이 복지 공약을 늘어놓자 “Where’s the beef?”로 받아친 것이다. 방청객이 폭소를 터뜨리자 먼데일도 멋쩍게 따라 웃었다. 먼데일의 참패였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현란한 무상 공약으로 청년층을 흔든다. 주립 및 공립대학 공짜 학비와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선심 퍼레이드다. 공짜 학비는 월스트리트 투기자에 대한 세금으로 조달하고 의료보험은 자본이득과 배당 등 주식 부자 소득에 세금을 더 물린다는 것이다. 원금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몽땅 세금으로 털리면 누가 월스트리트에 남을까. 일부 청년은 열광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을 질타하는 경제학자 칼럼이 줄을 잇는다. 샌더스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힐러리 클린턴 대세론이 굳어지는 형세다.
한국에서도 선심 공약의 폐해는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진흙탕이다. 도로와 같은 설비 투자는 한 차례 지출로 끝나지만 복지 지출은 일단 시작하면 매년 반복된다. 폭증하는 국가 부채는 아랑곳없이 선거 때마다 추가되는 ‘공약더미’는 국가적 재앙이다.
무책임한 공약을 견제하려면 국민의 회계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회계는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 지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을 따지는 시스템이다. 복지 지출은 소요 재원과의 균형을 따져야 한다. 주택자금 차입한도 증액은 가계 부채 및 이자 부담 해결 방안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쓸 돈을 마련할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 대기업이 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파가 선결돼야 한다.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출자 규제를 강화하면 대기업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세계 일류기업이 대형화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우리만 대기업을 쪼그라뜨리는 자충수를 계속해야 할까. 한쪽 측면만 들추는 선동보다는 다른 측면까지 균형 있게 분석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
샌더스는 일부 부유층의 일탈을 꼬집으며 청년이 분노하도록 앵그리(angry)를 부추긴다. 분노를 품고 투표장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하라는 것이다. 클린턴의 대응은 명쾌하다. “앵그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솔루션을 찾는 헝그리(hungry)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는다. 정치권이 앞장서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결집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분배를 맡긴 형국인 선거구 획정이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겨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신설 또는 재편되는 선거구에서 누가 출마할지도 깜깜하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어느 당에서도 선거 공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간 여유가 이젠 없다. 선심성 공약의 재앙을 줄일 절호의 찬스다. 산만한 복지 지출을 정비해 효율성 제고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후보를 가려내 당선시켜야 한다. 식상한 일자리 공약보다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 정착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속보] 美백악관 "한국 계엄령 선포 사전에 통보 못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