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300억 밑으론 두산 공작기계 매각 않겠다"…박용만 최후통첩에 완강하던 MBK도 손들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 공작기계사업부 매각 막전막후
두산 1조3000억 이상 주장…MBK 1조1000억 이하 고수
지루한 평행선 달리던 협상, '거래 백지화' 들고 나온 박용만 회장 지휘로 전환점
두산 자금수혈 숨통 트고 MBK는 조단위 거래 성공
두산 1조3000억 이상 주장…MBK 1조1000억 이하 고수
지루한 평행선 달리던 협상, '거래 백지화' 들고 나온 박용만 회장 지휘로 전환점
두산 자금수혈 숨통 트고 MBK는 조단위 거래 성공

2일 오후 5시. 양측 변호사가 1조1300억원의 가격에 최종 도장을 찍었다. 전날 밤을 꼬박 새운 3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끝난 것이다.
두산의 이번 공작기계사업부 매각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49% 소수 지분 매각에서 경영권 매각으로 거래 조건이 변경된 데다 인수 대상자도 한 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12월21일 공식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SC 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돌아섰다.
두산은 차순위 협상자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협상에 들어갔다.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가격에 대해 서로 ‘눈높이’가 달랐고 그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두산은 1조3000억원 이상의 매각가를 내세운 반면 MBK파트너스는 1조1000억원 이하를 고수했다. 거래금액 책정의 근간이 되는 EBITDA(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 대해 서로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두산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공작기계사업부의 가치가 올라간 점을 반영해 연간 1770억원의 EBITDA를 책정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구조조정이 오히려 장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팽팽한 대치 끝에 지난달 26일로 약속했던 협상시한이 지났다. 거래 무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양측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두산은 내부적으로 1조3000억원이라는 가격도 거래 초기 예상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가격 인하는 곤란하다는 견해였다. MBK 측은 유효 인수 후보가 자신뿐이라는 점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 두산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박 회장은 MBK파트너스에 넘어간 거래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해 “거래금액 1조1300억원 밑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 그 돈을 줄 수 없으면 협상팀을 철수시키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두산이 1700억원의 감액을 제시한 만큼 MBK 측도 적정선에서 양보하라는 압박이었다.
사실 MBK파트너스라고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펀드 자금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3조원에 육박하는 3호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로 펀드 결성 4년째지만 펀드 소진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매각 초기 1조5000억원까지 거론되던 공작기계사업부의 가치를 고려하면 1조1300억원이라는 금액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었다.
1조130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 같은 양측의 사정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타결됐다. 박 회장의 막판 승부수가 먹힌 것이다.
두산은 대규모 자금 수혈로 그룹 자금운용에 숨통을 텄고,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에 이어 또다시 조(兆)단위 거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대표 PEF 운용사로 이름을 높였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측 모두 중요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겼다”고 평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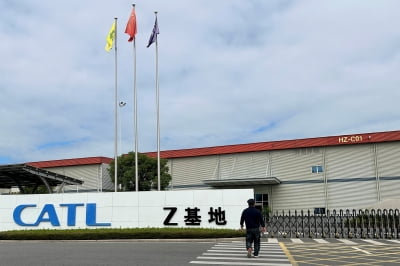
!["코로나는 양반이었다"…'최악의 위기' 맞은 황학동 주방거리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340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