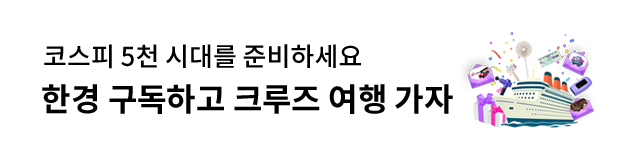KISDI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어쩌면 통신사 간 극렬한 대립을 의식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정부 용역 보고서가 시장에 ‘시그널(signal)’을 주기는커녕 ‘노이즈(noise)’만 증폭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부터 갈피를 못 잡으니 국책연구소만 나무랄 수도 없다.
노이즈로 가득찬 통신·방송
통신·방송시장이 노이즈로 가득찼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건을 놓고 ‘된다’ ‘안 된다’로 쫙 갈라진 사업자들이 그들만의 활극을 벌이면서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각 사업자 캠프에서 ‘말 전쟁’의 선두에 선 이들은 다름 아닌 KISDI 출신 박사들이다. 교수들은 한술 더 뜬다. 사업자와 무슨 이해관계가 얽혔는지 특정 사업자를 대신해 탈레반처럼 싸운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영락없는 정치판이다. 시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통신·방송은 정부가 여전히 ‘큰손’ 역할을 하는 규제 산업이다. 정부의 시그널이 분명하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될 리 없다. 사업자들이 인수합병(M&A) 건이 나올 때마다 ‘규제 게임’ ‘정치 게임’에 열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 파행이다. 정부의 통신·방송 규제정책이, 또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통신·방송 관련 법이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운용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오는 대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건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툭하면 위원회다. 여차하면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곗거리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치열한 로비전이 눈에 훤하다. 이게 통신·방송의 미래를 말한다는 부처가 내놓을 해법인가.
AI? 조롱받는 정부 시그널
인공지능(AI) 개념이 1940년대에 등장했으니 70년이나 흘렀다.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다. 실제로 몇 번의 부침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보장이 없다. 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알파고가 화제를 불러오기 무섭게 미래부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발전전략을 쏟아냈다. 정부가 AI를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민간도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30억원씩 출자하는 민간 조직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지 알파고보다 정부가 더 놀랍다.
정부가 내놓는 계획이 민간에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그건 노이즈나 다름없다. 아니나 다를까, 기업과 과학계 반응은 냉소에 가깝다. 과학정책이 얼마나 변덕스러웠으면 이렇게 조롱받겠나. 정부가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의 진원지가 된 건 과학, 통신·방송만이 아니다. 경제정책 운용조차 오락가락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나.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 박사 ahs@hankl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