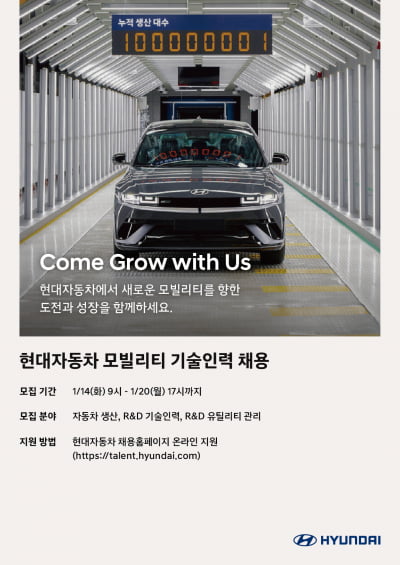영국 산업혁명·자유무역 견인
그런 상황에서 산업혁명과 자유무역의 물꼬를 튼 게 《국부론》이다. 이 책은 그 유명한 ‘핀 생산 공정’의 분업론으로 시작한다. 핀 하나 생산에 18개 공정이 필요한데 이를 한 사람이 다 하면 하루 20개도 안 되지만 10명이 나눠 하면 최대 4만80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업은 노동뿐만 아니라 직업 분화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상품 생산에 전념하고 이를 시장에 팔아 얻은 화폐로 각종 생활용품을 사는 교환사회가 거기에서 탄생한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므로 기술이 향상되고 생산력이 커지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본축적도 가능해진다. 이것이 곧 근대 시민사회의 경제 동력이다.
영국에서도 이전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생산성이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이때를 계기로 상황이 반전됐다. 그런 점에서 《국부론》은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 혁명을 함께 이끈 성장 엔진이다. 이후 증기기관 상용화 등 기술 혁신에 힘입어 서양은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는 동안 조선은 쇄국의 울타리에 숨어 지냈다. 찌그러진 그릇을 쓰면서도 물건 만드는 것을 천하게 여겨 공장(工匠) 및 목축과 기술이 형편없었다. 농사짓는 방법이 나빠 수확이 적고, 상업 박대로 통상무역도 가로막혔다.
그나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건 북학파의 젊은 실학자들이었다. 그중 박제가는 중국을 네 번이나 다녀오면서 서구 문명과 학문, 기술을 감지했다. 그가 《북학의(北學議)》를 쓴 것은 1778년, 《국부론》보다 2년 뒤였다.
조선에선 성리학에 갇혀 좌절
그도 노동 분업과 직업 분화를 강조했다. 가난을 구제하고 국부를 키우려면 상공업과 교역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궐의 국가 의식 때마저 거적때기를 깔아야 하고, 궁문 수비병이 무명옷에 새끼줄로 띠를 맨’ 궁상을 면할 길이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의 개혁안 골자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이었다. 국가적으로 상업을 진흥하고, 배와 수레 같은 유통수단을 정비해 대외무역을 키우며, 선진 기계설비를 도입해 기술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막는 봉건제도를 뜯어고치고, 도량형을 표준화하며, 벽돌을 사용해 가옥 구조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놀고먹는 양반들을 상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지나친 검약보다 적정 소비로 생산을 촉진시키자는 경제 활성화법까지 아울렀다. 당시 국가와 사회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이 바로 《북학의》다.
하지만 그의 혁신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상업적 이익이나 물욕을 죄악시한 성리학에 반했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천박한 상업을 내가?” “반상 구분을 없애?” “서얼 주제에…”라며 괘씸해했다. 결국 그는 노론 벽파의 미움을 받아 유배 길에 올랐다. 그렇게 ‘조선판 국부론’은 사장되고 말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살리기보다 공리공론,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정치권 행태는 변함이 없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