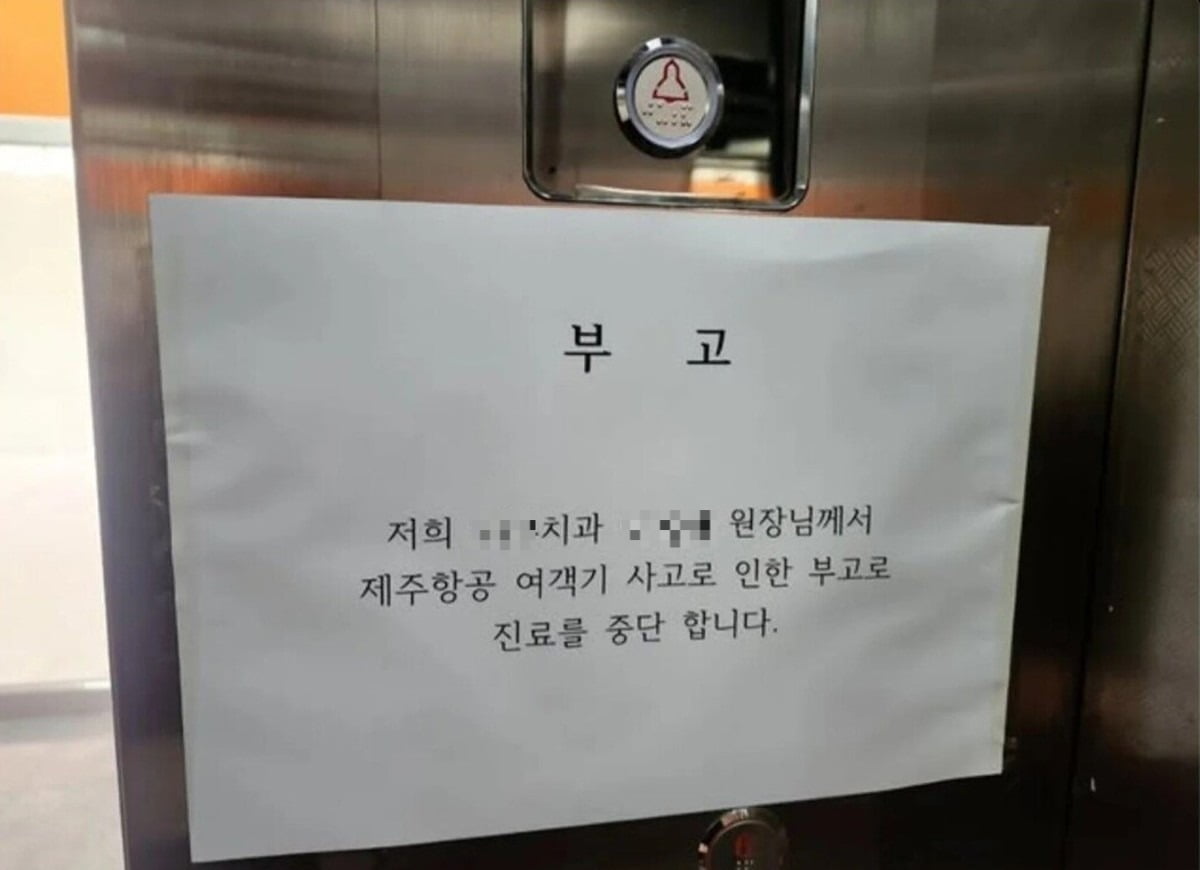영국은 2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EU 탈퇴란 결론을 냈다. 그간 영국에선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란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탈퇴 진영으로 나눠 팽팽한 여론전을 펼쳐왔다. 최종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43년 만에 ‘하나의 유럽’을 떠나게 됐다.
한국유럽학회장을 지낸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다. 영국의 위치나 경제규모로 봤을 때 잔류하지 않겠느냐는 ‘합리론’이 강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면서 “국민 정서상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영국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역사적 전통과 최근의 쟁점 두 가지에서 찾았다. 영국이 유럽 대륙에 대한 균형자 또는 세력조정자 역할을 해온 ‘명예로운 고립’ 노선의 연장선상이란 해석이 전자에 속한다. 후자는 난민 유입 확대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정서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양대 주요국가로 서 있는 상황에 유럽 경기침체, 난민 유입 등이 더해져 브렉시트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열린 한국EU학회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던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EU 회원국으로 얻는 경제적·지정학적 편익이나 브렉시트에 따른 정치적·지정학적 여파를 감안하면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부분 이같은 이유를 들어 영국의 EU 잔류를 점쳤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제3자 입장에서 예상한 합리적 선택과 현지의 정서적·역사적 맥락은 달랐던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EU에 뒤늦게 합류한 후에도 자국 통화(파운드화)를 유지하는 등 유럽 대륙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다. EU 회원국 중 역내 교역 비중이 낮고 역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U와의 학문적 교류 업무를 맡았던 영남지역 한 대학 교수도 “영국이 큰 국가지만 EU에선 후발 주자고 EU 내에서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요소들이 결국 브렉시트라는 예상외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탈퇴가 EU 내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빅3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EU에서 나오면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전지구적 세계화와 통합 추세를 이어온 세계질서 흐름을 바꾸는 ‘반(反)세계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