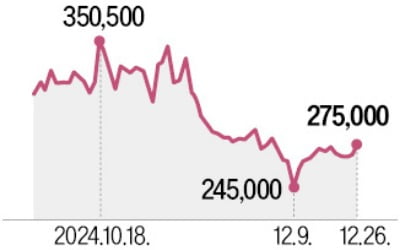생명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은 기초과학 발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2014년 하반기 얘기를 꺼냈다. IBS와 서울대에 모두 소속된 김 단장은 당시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이어 네 차례 감사를 받았다.
"연구 몰입하고 싶다"는 호소
김 단장이 일하는 IBS는 한국인 첫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신설한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이다. 최고 과학자를 선발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며 노벨상 수상자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IBS는 올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리실은 대형 국책사업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검사까지 투입해 평창 동계올림픽, IBS를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사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고 과학자들조차 연구에 몰입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IBS 사례는 우리 과학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일반 정부 출연연구소는 IBS보다 연구개발(R&D) 여건이 더 열악하다. 본업인 연구보다 과제 수주 경쟁, 평가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연구원이 많다.
우리나라는 한 해 19조원이 넘는 돈을 정부 R&D에 쏟아붓고 있지만 신시장을 창출할 파괴력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논문 건수와 같은 양적 기준만 중시하다 보니 연구자들이 실패하지 않을 연구에만 안주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과학계는 호기심과 독창적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블루스카이(blue sky)’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을 일으킨 나카무라 슈지 UC샌타바버라 교수의 청색 LED 연구도 처음에는 호기심과 불가능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도전을 늘리려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연구 환경부터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 R&D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제 수주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17개 R&D 평가 관리기관을 재편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발표했다. 1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찾아보긴 힘들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R&D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뿌리까지 근절해 불만 제로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존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질타한 의미가 강하다.
또 조직 늘리는 공무원들
그런데도 정부는 전략회의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둔 채 미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공무원 13명으로 구성한 지원단 조직을 신설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난해 10월 미래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출범시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조직을 늘렸다. R&D 혁신을 빌미로 공무원 자리만 늘린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중간 관리 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하는 혁신 방향에도 맞지 않는 선택이다. 출연연, 대학 등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공무원들은 곱씹어봐야 한다.
김태훈 IT과학부 차장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