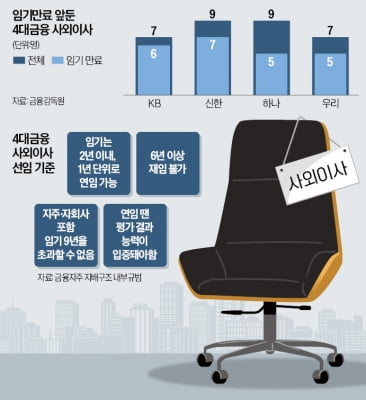장창민 산업부 기자 cmjang@hankyung.com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다. 지난 11일 정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발표한 후부터다. 정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팔린 차량의 운행과 거래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한다. 우선 신차는 안되고 기존에 구입한 폭스바겐 차량은 도로 위를 계속 달려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 탓이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에 대한 서류를 조작한 점이 드러난 이상, 신차 판매 중단뿐만 아니라 판매된 차량도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두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문제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이 비용을 대고 리콜(결함시정)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해당 79개 모델은 국내에서 약 7만9000대 판매됐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전체 차량(약 30만대)의 26.3%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 잘못으로 차량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주들의 기존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 해당 모델을 모두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모델별로 샘플을 뽑아 임의 검사를 해 해당 차량의 문제가 드러나면 강제리콜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의문은 정부 말대로 소비자 피해가 과연 없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차량 운행과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은 중고차값 하락이나 애프터서비스(AS) 부실 등 간접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 나중에 강제리콜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조치가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나중에 강제리콜을 하더라도 소비자 불편까지 피해로 규정해 이를 강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창민 산업부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