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기술격차 2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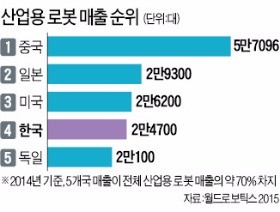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AI시대, 한국의 현주소’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 대비 75% 수준이다. 인지로봇 또는 소셜로봇으로 불리는 차세대 로봇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차이는 2년 정도로 추정된다.
현실의 격차는 더 크다는 게 학계 및 재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제작한 ‘페퍼’ 외에도 해외에선 상용화에 성공한 소셜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개발한 ‘지보’도 올해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껏 받은 투자금만 2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도 2019년부터 가정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소니의 애완로봇 ‘아이모’가 실패한 이후 일찌감치 가정용 로봇의 상용화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다. 삼성, LG전자 등이 최근에야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서울대, KAIST 등의 소셜로봇 연구진은 열악한 국내 기반 탓에 소프트뱅크와 제품 개발을 협력해야 할 정도다.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인력도 턱없이 모자란다. 1962년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한 미국 스탠퍼드대는 교수진만 30여명에 달한다. 서울대엔 인공지능 전공자가 장병탁 교수 한 명뿐이다. 게다가 인지과학연구소라는 문과 주도의 연구소에 소속돼 있다. ‘모션로봇(인간의 움직임을 닮은 로봇)’과 소셜로봇 간 교류가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결합이 글로벌 트렌드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융합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정부도 2020년까지 로봇 생산 규모를 6조원(지난해 2조6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로봇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준호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더 이상 도전하려 하지 않고 학교에선 모범 답안만 강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분석+]美버텍스 진통제 신약 FDA 문턱넘자…비보존·SK바이오팜도 도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67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