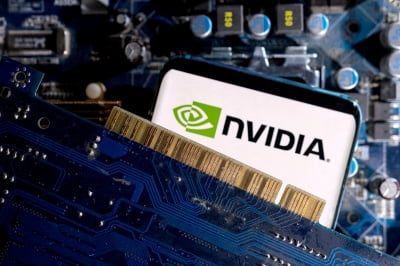[삼성에 2차 공세 나선 엘리엇]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세에 취약한 한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문가 진단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삼성에 2차 공세 나선 엘리엇]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세에 취약한 한국](https://img.hankyung.com/photo/201610/01.12645375.1.jpg)
헤지펀드의 과거 투자전략은 ‘수동적’ 자세가 지배적이었다. 수익을 내주는 주체는 투자 대상이고, 헤지펀드는 레버리지(증거금 대비 총투자 금액) 비율을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만큼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투자전략에 변화를 몰고 온 것은 2008년 금융위기다. 이때부터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전환됐다. 미국 단일금융법의 핵심이 된 ‘볼커 룰’에서는 헤지펀드의 상징인 레버리지 비율을 5배 이내로 엄격하게 규제했다.
하지만 엘리엇의 운용자인 폴 싱어와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 등은 새로운 규제환경에 따라 변신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명목을 내걸고 투자대상 기업의 모든 것에 간섭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에 목말라 하는 투자자가 자금을 몰아주면서 급성장하는 추세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인 정신’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윔블던 현상’(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이 심한 국가는 외자유입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공생적 투자를 하지 않고 국부 유출만 시키는 점이다.
경제정책 무력화도 걱정된다. 외국자본은 수익을 최우선시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적 외자선호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과다 외화보유액과 경상수지흑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자유치 때 우리 경제에 공생적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내 자본의 육성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검토해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한국계 자금만 따지는 ‘은둔의 왕국’적인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언제든지 백기사가 될 수 있는 자본을 우대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심해질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국부를 지킬 수 있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