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작전처럼 은밀하게…들통나면 '배신자'
그 놈의 정 때문에…회사 회유에 주저앉기도
사측"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체자 올 때까지만" 잔류 설득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협박도
회사 아직도 안 떠났어?
이직 실패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
사내에선 "언젠가 나갈 놈" 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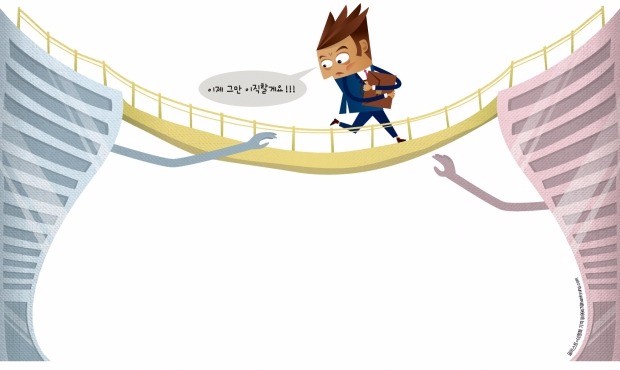
막상 이직을 결심해도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일은 힘들다. 이직을 최대한 만류하려는 회사 및 동료와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탓이다. 이직 과정에서 울고 웃는 김과장 이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회사에 두 번 속아 이직 기회 놓쳐
이직을 시도하는 직장인은 회사를 나서는 문턱에서 각종 감언이설에 한 번쯤 발목을 잡힌다. 한 유통업체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주임(34)은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입사 직후부터 마케팅 부서 근무를 희망했다. 사내 인사 이동이 쉽지 않자 2014년 업계 내 다른 회사의 마케팅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담당 간부에게서 “회사에 머물면 마케팅 부서로 옮겨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김 주임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직을 포기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보직 이동은 없었다. 담당 간부에게 약속 이행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지난해 다시 이직을 추진했다. 이번엔 담당 부장이 “내년 승진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며 만류했다. 얼마 전 승진 인사 발표날,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김 주임은 “이번에는 어떤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단언했다.
회사에 대한 인간적인 정과 ‘동료애’에 이끌려 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A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하는 정모 과장은 동료들 때문에 이직 시도를 접었다. 그가 B사로 옮길 것이란 소식을 접한 동료들이 B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수소문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과장은 B사가 생각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애초 영입 조건으로 내건 주5일 근무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가끔 ‘그때 옮길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발품을 팔아 정보를 물어다 줄 정도로 저를 아끼는 동료들이 있어 그때 결정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때론 사측의 으름장과 협박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건설회사 1년차 직원인 최모씨(28)는 요즘 시쳇말로 ‘멘붕’이다. 작년 말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잦은 회식과 야근에 지쳐 얼마 전 퇴사 의사를 밝혔다.
팀장은 “네가 하는 일 대신할 사람 뽑을 때까진 당장 퇴사가 어렵다. 적어도 내년까진 있어 달라”며 잔류를 설득했다. 담당 임원도 “조금만 기다리라”며 퇴사원 수리를 한사코 거부했다. 직속 과장은 “정 나가고 싶다면 보내주겠지만 여기 업계가 좁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렇다 보니 최씨는 딜레마에 빠졌다. “퇴사를 밀어붙이자니 ‘회사 사정 고려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 될 거 같고, 그냥 있자니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롭네요.”
이직 시도 들통나 ‘배신자’ 취급
이직 성공의 열쇠는 철저한 ‘보안’이다. 행여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3년차 직장인 정모씨(30)는 최근 이직을 준비하며 ‘007작전’에 버금갈 만큼 은밀하게 움직였다. 주변 동료들에게 퇴사나 이직 등과 관련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불만도 속으로 삼켰다. 다른 회사 정보를 알아보거나 면접을 볼 때도 관련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동안 소문 탓에 이직을 이루지 못한 사례를 무수히 봐왔기 때문이다. 한 선배는 6개월 전 타사 면접을 본 게 소문이 나 이직을 포기했다. 부서장이 직접 그 회사에 항의전화를 하고 매일같이 술을 사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1년 전엔 회사의 한 팀에서 차장 이하 팀원 다섯 명 전원이 단체로 C사 이직을 준비하다 실패했다. 초기에 소문이 나면서 부담을 느낀 C사가 이직 제안을 철회했다. 정씨는 “그 팀은 아직도 사내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 대리(32)는 얼마 전 동종 업계로 이직을 시도했다. 지금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갑갑함을 느껴 분위기가 좀 더 낫다는 다른 회사에 지원했다가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어찌된 일인지 지나가는 김 대리를 본 상사들이 ‘배신자’ ‘역적’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엔 건너편 부서 과장으로부터 “김 대리, 아직도 회사 안 때려치웠어?”라는 얘기도 들었다. 곧 있으면 연말 인사 고과가 나올 시점인데, 이대로는 최하 등급을 받고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김 대리는 자신이 이직을 시도한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자기 회사로 경쟁사 직원이 이직을 시도한 정보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정보를 흘리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떠나면 다신 안 본다’는 말에 속앓이
설사 이직에 성공했더라도 이직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이모씨는 3년 전 이직을 하면서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당시 그의 이직을 만류한 상사는 “앞으로 우리 인간관계는 끝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 압박했다. 이씨는 “처음엔 ‘그만큼 아껴온 내게 실망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냥 미안했다”고 했다.
이후 이씨는 명절 때마다 옛 상사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며 인연을 이어 나가려 했다. 기대는 지난해 옛 회사 동료 결혼식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우연히 마주친 옛 상사에게 용기를 내 인사했지만 본체만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직이 무슨 대역죄도 아니고. 괜한 기대를 품은 제가 바보 같습니다.”
옛 상사가 이직의 지렛대가 되는 사례도 있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던 조모씨(28)는 2년 전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다. 처음에는 훌륭한 멘토로 보였던 팀장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간섭하는 것이 숨막혔기 때문이다. 회사를 옮긴 날 그는 새 직장의 인사팀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평판조회 때 전 회사 팀장이 조씨의 업무 태도와 능력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는 것. 결국 그의 말이 이직에 결정적인 힘이 된 셈이다. “새 회사에 출근한 날 전 회사 팀장님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을 보내주셨어요. 회사를 나올 때는 팀장님에게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는데, 팀장님 덕분에 이직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형주 / 윤아영 / 김태호 기자 ohj@hankyung.com


![106주년 3·1절에 '녹 눈물' 흘리는 독립문 [사진issue]](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659303.3.jpg)



![[단독] 한국서 편의점은 미친짓?…결국 터질게 터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1053508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