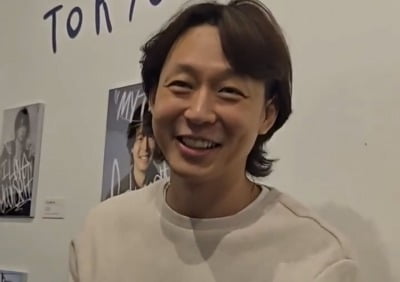[Law&Biz]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큰돈 벌려는 생각 버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로펌 창업자에게 듣는다 - 황주명 충정 회장
"유신 체제서 재판 불편했다"
부장판사 승진 앞두고 법복 벗어
한국 사내변호사 1호 출신
국제로펌서 내공 쌓은 뒤 독립
변호사는 돈에 연연하면 안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집중해야
"유신 체제서 재판 불편했다"
부장판사 승진 앞두고 법복 벗어
한국 사내변호사 1호 출신
국제로펌서 내공 쌓은 뒤 독립
변호사는 돈에 연연하면 안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집중해야
![[Law&Biz]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큰돈 벌려는 생각 버려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2983391.1.jpg)
1975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법관 연수를 마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까지만 해도 그가 중도에 법복을 벗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부장판사 승진이 코앞인 데다 고시 동기들 중 선두주자였던 그가 판사직을 그만둔다고 하자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 한 달 이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부친인 황동준 변호사가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간청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유신 체제 아래 재판을 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황 회장은 법복을 벗은 뒤 바로 법률사무소를 차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동료 판사들에게 사건 들고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기업행을 택했다. 1977년 대한석유공사(현 SK) 상임법률고문이 됐다. 우리나라 사내변호사 1호다. 1년 뒤에는 대우로 옮겼다. 경기고 2년 선배인 김우중 당시 회장이 불렀다. 대우그룹 법제실장(상무)이 그의 공식 직함이었다. 김 회장은 각종 법률자문은 물론 영어도 능통한 그를 아꼈다고 한다. 그 역시 “김 회장을 따라 1년에 100일씩 해외를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다”고 술회했다. 특히 외국 기업에선 경영진이 법대로 기업을 경영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는 경영 방식이 조금 달랐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이유다. 당시 황 변호사는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야당 당수’라는 별명도 이때 붙었다.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김 회장에게 황 변호사는 “일요일에는 근로자들을 쉬게 해줍시다”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회장이 “삼성, 현대를 이겨 1등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칠 때도 “세계적 기업이 되려면 법대로 경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됐다.
대우를 나온 황 변호사는 1981년 김장리로 들어갔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김흥한 변호사와 그의 장모이자 국내 여성 변호사 1호인 이태영 변호사가 함께 세운 국내 최초의 국제로펌이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장대영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세 사람 성을 딴 ‘김장리’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황 변호사의 가세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1991년 김앤황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김흥한 변호사가 동서인 김의재 변호사 및 사위인 최성준 변호사와 더불어 가족형 로펌으로 운영할 뜻을 비치면서 황 변호사는 다시 둥지를 떠나야 했다. 목근수, 박상일 변호사를 비롯해 총 8명이 함께 나와 1993년 서대문 충정로에 세운 것이 법무법인 충정이다. 황 변호사는 주 고객이던 외국계 기업에 젊은 변호사들의 건재와 새 로펌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충정의 영문 명칭은 황주명, 목근수, 박상일, 진만제의 첫 글자를 따 HMP&J로 했다.
◆“돈 벌려고 변호사 해선 안돼”
50년 법조 인생을 산 황 회장은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많았다. 그는 “변호사가 돈을 적게 번다고 생각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했다.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하니까 힘든 직업이 됐다는 지적이다. 12년간의 판사 경력을 접고 사내변호사로 간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당장 개업하면 돈 많이 벌 텐데…”라고 말렸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검사를 퇴임하고 나오는 다음날부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이 아직도 많다”며 “이런 법조인 DNA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