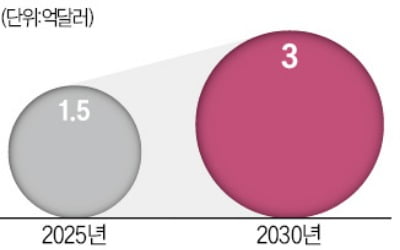회동 이후 이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3명은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를 벤치마킹해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초대 회장은 이 창업주가 맡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8년 이름을 지금의 전경련으로 바꾸고 활동 범위도 넓혔다. 주요 민간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을 회원사로 영입하며 외형도 확장했다.
전경련은 한동안 ‘재계 맏형’으로 불렸다. 이 창업주 이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구자경 LG 명예회장, 고 최종현 SK 회장, 김우중 대우 회장 등이 전경련 회장을 맡았다. 재계 현안은 전경련에서 논의됐다.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 이후 산업합리화 조치를 할 때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 회장실에서 수싸움을 벌였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빅딜협상도 전경련 차원에서 조율됐다.
분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달라졌다. 김우중 회장이 1999년 그룹 해체와 함께 전경련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만 해도 여러 차례 고사했다. 허창수 현 회장(GS 회장)도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이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전경련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는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