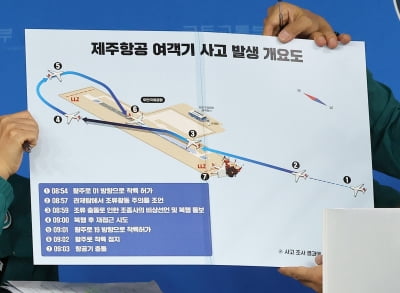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가 차명 휴대전화인지는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가 차명 휴대전화인 것을 알았나'라는 물음에 "대통령은 아마 (우리가) 드리는대로 쓰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의당 측은 "헌재 심판대에 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대통령도 차명폰을 썼다고 답했다. 비서관부터 행정관,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안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라며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쓰이는 게 대포폰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정당한 국가업무라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정상이다.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해 기록을 숨길 일이 아니다. 흔적 남기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숨기고 싶었던 추악함이 넓고 깊다는 증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9일 국회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덕수 탄핵은 무리수였나…박근혜 때와는 분위기 다르다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6473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