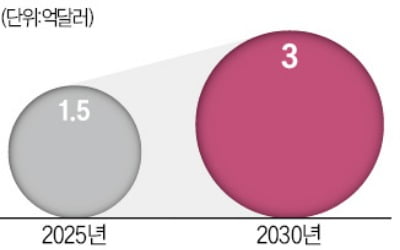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이학영 칼럼] "이러려고들 경제학 하셨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의 고도성장 이끈 주역은 '시장경제' 전파한 경제학자들
한국엔 '선거용 정책 기술자'만 판쳐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한국엔 '선거용 정책 기술자'만 판쳐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이학영 칼럼] "이러려고들 경제학 하셨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01.11998131.1.jpg)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이념의 힘》은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일궈낸 고도 성장은 치열했던 사상경쟁과 이념 변화 덕분”임을 증언한다. 중국 사회가 ‘따궈판(大鍋飯: 큰 솥에 밥을 지어서 고르게 나눠먹는다는 평등분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삼았던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에게 중국인들은 ‘우시장(吳市場)’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그가 덩샤오핑 시대 개혁·개방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지냈기 때문이다.
후안강 칭화대 교수는 세제 개혁과 자유무역, 천제구이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기업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위융딩, 왕멍구이, 판강 등도 중국 인민에게 자유경쟁과 시장가격, 사유재산권, 기업가정신 등 경제 발전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을 일깨워준 ‘경제학 전사(戰士)’들로 기억돼 있다.
철옹성 같았던 주류 마르크스경제학 진영에 맞서 ‘사상 해방’을 요구하고, ‘진리(眞理)기준’ 토론을 벌이며 시장경제의 길을 닦았던 이들의 험난했던 여정(旅程)과 비교돼서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한국의 대권주자 캠프에 뛰어든 경제학자들이다.
‘국민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주요 대권주자들이 경제분야 공약으로 ‘성장’ 앞에 한결같이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게 한국 대통령 선거전의 특징이다. 표현만 다를 뿐, 다들 ‘격차 해소’를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부분 공약에서 대권주자들 간 차이를 찾기 힘들다. 대기업들이 사업영역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최대한 양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부족한 재원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정책들이 선(善)해 보이는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할지를 비슷한 과거 사례까지 찾아내 치밀하게 검증해서 보완하고 다듬는 게 전문가들의 몫이다. 기업 간 사업영역의 인위적 조정의 부작용은 LED조명·단체급식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뒤 나타났던 문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들이 ‘양보’한 자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
시장을 대신해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는 아르헨티나가 오래전에 입증했다. ‘포퓰리즘의 원조’ 후안 페론 정부는 1950년대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자 전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실험’을 벌였지만, 국고와 함께 시장경제의 자생력까지 거덜내는 참극(慘劇)으로 끝났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국 간에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한 세금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음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대로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권주자들 캠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한 정책들을 벽돌 찍어내듯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이면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적인 예다. 일회성 사업으로 1년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재원 조달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언급을 생략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격을 자초했다.
문 전 대표의 캠프에는 좌·우와 중도를 망라했다는 800여명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몰려들어 있다. 그의 캠프만이 아니다. 주요 대권주자들 캠프마다 장밋빛 구호로 치장한 경제공약을 개발하는 작업에 ‘경제학 전사’들이 북적대고 있다. 절망의 심연(深淵)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질 게 뻔한, ‘가짜 사탕’을 쥐여 주는 ‘선거용 정책용역 기술자’가 넘쳐난다면 정말 비극이다.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