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스타의 A급 성적은 옛말…콘텐츠도 'B+ 프리미엄' 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희경 기자의 컬처 insight
이영애 복귀작 제친 '김과장', KBS 예능대상 받은 김종민
'화려한 타이틀' 보다 평범한 일상에 가치 부여한 소소한 콘텐츠가 흥행
이영애 복귀작 제친 '김과장', KBS 예능대상 받은 김종민
'화려한 타이틀' 보다 평범한 일상에 가치 부여한 소소한 콘텐츠가 흥행

13년 만에 컴백한 이영애 주연, 200억원이 넘는 제작비. 이 화려한 타이틀의 사임당에 관심이 쏟아졌다. 반면 ‘명품 조연’이지만 이름은 낯선 남궁민이 나오는 김과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우연의 연속으로 의인(義人)이 돼 가는 과정을 그린 김과장엔 그저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평범한 회사 이야기가 더해졌을 뿐이다.
하지만 시청률은 정반대였다. 지난 16일 사임당은 10.3%, 김과장은 17.6%를 기록했다. 입소문은 ‘김과장 열풍’까지 만들어냈다. A급 스타가 출연하면 성적표도 A를 받던 공식이 또 한 번 깨졌다.
콘텐츠 시장에도 ‘B+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B+프리미엄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제시한 올해의 주요 소비 트렌드다. 평범한 B급의 제품에 특별한 가치, 즉 프리미엄을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제품·서비스 소비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 콘텐츠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은 더 이상 빛나는 A급 스타와 대작만을 좇지 않는다. 평범해 보여도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별과 소소한 콘텐츠가 사랑받는다. 명품이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찾듯, 콘텐츠 선택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KBS의 예능 대상을 차지한 김종민에게도 이 공식은 통한다. 그는 눈에 띄는 대형 스타는 아니었다. 그저 TV를 틀면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방송인이었다. 그는 10년간 한결같이 예능 ‘1박 2일’의 자리를 지켰다. 2007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멤버는 숱하게 교체됐지만 김종민은 묵묵하고 여전했다. 어리숙해 보여도 순수하고 소탈한 모습을 사람들은 친근하게 여겼다. 때로는 그의 해박한 역사 지식에 놀라기도 하며 그 이상의 가치도 발견했다.
이런 현상엔 ‘투영’의 코드가 작용한다. 화려함이 가득한 스타와 콘텐츠는 나와는 거리가 먼 명품과도 같다. 과거엔 이 명품에 열광했다.
하지만 변했다. 지금은 평범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싶은, 나만의 욕구를 투영할 대상과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을 채워주고 감정을 이입하고, 공유하려 한다. 이럴 땐 편하고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B+프리미엄 스타와 콘텐츠가 제격이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는 저서 《대통령과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말한다. “스타가 홍보하는 명품도 생활 속에 들어오면 ‘something special(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anything else(아무거나)’가 된다.” 겉만 화려한 인물과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중은 ‘anything else’로 보였던 것에서 ‘something special’을 느끼길 원한다. “대상 후보에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것 같다”는 김종민의 수상 소감에서 ‘something special’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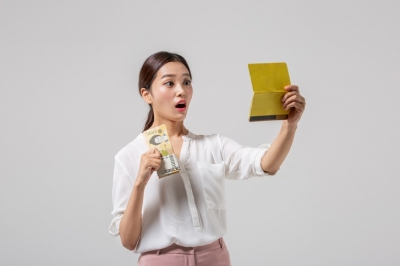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