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혁 지음 / 글항아리 / 336쪽 / 2만원


임금의 구혼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왕이 곧 신붓감을 찾아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 대부분의 양반가는 딸을 시집 보내거나 나이를 속여 처녀단자 제출을 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딸은 궁궐에 평생 갇혀 지내야 하고, 가문은 조정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간택 과정에서 쓸 의복과 가마 등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부 권력가문의 딸이 이미 내정돼 있을 가능성도 컸다. 처녀단자를 제출한 신부 후보들은 세 차례 간택 과정을 거쳤다. 탈락자에겐 푸짐한 선물을 주고 귀가시켰다. 저자는 “반강제에 따른 신부 후보 집안의 불만을 달래고,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택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덕행과 문벌, 가훈이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조선 영조 기록에는 “요즘 간택은 용모가 예쁘고 말씨가 우아한 여자를 선호해 불경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율곡 이이나 우암 송시열 등도 당대 임금에게 “왕비를 고를 때 용모와 자태, 옷맵시를 따지지 말라”고 건의했다.
간택된 여성은 ‘비씨’라 불리며 별궁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삶은 확 달라진다. 생활용품에서부터 탈 것과 의복을 궁중 품위에 맞는 것으로 새로 받고, 시중드는 궁녀도 붙었다. 바깥출입은 전혀 할 수 없었다.
궁궐에선 예비 신부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갖가지 준비를 했다. 일단 사가를 임대해 비씨의 집을 이사시켰다. 비씨의 원래 집이 별궁과 가깝더라도 가례를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야 했다. 인현왕후의 가례는 당시 정승의 집, 장렬왕후 조씨의 가례는 고판서의 집을 빌려 열었다.
왕비가 가례를 마치고 왕실 웃어른을 차례로 알현하는 조현례 행사에서는 글을 아는 의녀를 차출해 의장을 들게 했다. 세자빈 조현례에는 의녀 240여명을 기용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의녀가 모자라면 궁궐 여종이나 서울에 사는 기생을 뽑아 자리를 채우기도 했다.
임금 결혼식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아인 내수사와 결혼식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례도감이 맡아 진행했다. 국혼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 가례도감은 호조로부터 은돈 500냥, 전문(錢文, 돈) 75관, 명주로 짠 피륙 2동, 쌀 100석 등을 받았고, 병조로부터 전문 75관과 무명실로 짠 피륙 15동을 걷었다. 내수사도 호조와 병조에서 지원을 받았다.
저자는 “두 기구가 받은 예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총 6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는 호조가 1년간 운용하는 예산의 약 2%에 해당한다”며 “영조 40년에는 왕자녀의 가례가 겹치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혼정례를 편찬해 지나친 사치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후궁 중에서도 공식적인 혼례 절차를 거친 이들이 있다. 종2품 내관 직위인 후궁 숙의는 후궁에 봉해질 때 가례를 따로 치렀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도 숙의 출신이다. 사대부 집안의 후손으로, 정비인 단경왕후가 폐위된 뒤 왕비로 책봉됐다. 저자는 “숙의는 첩이라기보다는 왕비 예비 주자”라며 “일률적으로 후궁을 첩이라 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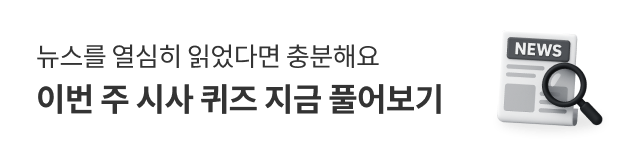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요즘 '붕어빵 노점' 안 보이더니…"월 160만원 내고 팔아요"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99.39026243.3.jpg)
!["이러니 성심당 줄서지"…또 터진 '케이크 과대 포장' 논란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70046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