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스마트 농업으로 기후변화 위기 넘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닐온실에 AI 접목 연구
반려동물 장난감 등도 개발
망고·파파야 등 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
상당량 수입 대체 가능
반려동물 장난감 등도 개발
망고·파파야 등 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
상당량 수입 대체 가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농진청은 농축산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농촌 지도·교육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소속된 박사급 연구인력만 1000명이 넘는다. 2014년 경기 수원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 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거쳐 작년 8월 취임했다.
한국 농업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다. 지난 100년(1911~2010년)간 한국의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했다. 2050년까지 상승폭은 3.7도에 달할 전망이다. 그때쯤이면 일부 내륙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정 청장은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가 가져다줄 ‘기회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내 연간 과일 수입액의 절반가량이 아열대·열대 작물”이라며 “전략적으로 유망 품목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재배에 나서면 상당 부분 수입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진청은 아열대·열대 작물의 토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 있는 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는 망고, 파파야 등 재배기술 개발을 마쳤다. 올리브는 제주에서 노지 재배(자연환경에서 재배하는 것)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 청장은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는 ‘여주’는 농진청이 10년 전부터 들여와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 작물”이라며 “재배면적이 116㏊에 이르면서 일부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 농업이 가능한 것은 ‘비닐하우스 온실’ 덕분이다. 정 청장은 “한국의 세계적 발명품인 ‘비닐온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면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된 ‘유리온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비닐온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진청은 인공지능(AI)을 비닐온실에 탑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고소득 작물의 파종 시기와 온도 같은 빅데이터 수집을 마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급성장한 반려동물산업 역시 정 청장이 눈여겨보는 분야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약 3000억원)의 70%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했다.
그는 “한때 무슨 반려동물까지 연구하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진출 가능한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부터 복분자 등을 활용한 기능성 프리미엄 사료 개발, 강아지 장난감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정 청장은 농진청 연구원 성과 평가 방식도 대폭 바꿨다.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과거엔 평가가 단일과제 위주로 이뤄져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영역엔 손대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융복합 과제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주=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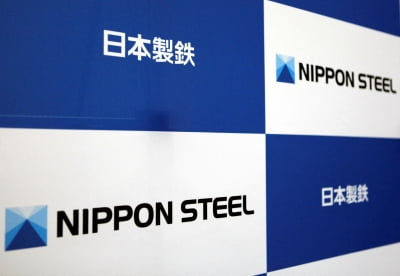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