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칼럼] 대선후보들의 역사인식이 궁금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상전벽해 이룬 한국
온갖 규제로 기업가정신 잃고 조로증 걸려
사회적 역동성·과학기술 혁신 기반 다져야 한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
온갖 규제로 기업가정신 잃고 조로증 걸려
사회적 역동성·과학기술 혁신 기반 다져야 한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
![[윤종용 칼럼] 대선후보들의 역사인식이 궁금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19973.1.jpg)
과연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인품, 능력, 역사 및 현실인식, 통찰력, 경제인식 등은 나라를 경영하기에 충분한가. 가장 잘 준비됐다는 후보의 안보, 경제, 일자리에 관한 공약의 논리조차 솔직히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은 건립 후 70여년 동안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선진국의 시스템과 제도, 과학기술, 산업생산기술을 모방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룩했다. 나라가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바뀌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도 1980~1990년대 한국을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역동성 있는 나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곧이어 온갖 기업 규제들이 들이닥쳤다. 기업과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사회도 반(反)기업정서로 돌아서며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가정신이 사라져갔다. 한국보다 앞서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250여년 전), 미국(200여년 전), 일본(150여년 전)에 비해 후발로서 아직 역동적이어야 할 나라가 그들보다 훨씬 빨리 기업가정신을 잃고 조로증에 걸렸다.
위기를 뛰어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역동성과 동기, 관성마저 잃고 멈춰서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근본 원인이 사회 시스템, 제도 등 사회지배구조에 있는지 혹은 국민성, 문화와 같은 민도(民度)에 있는지, 아니면 창의력이나 혁신성의 소진에 있는지, “왜?”라고 수없이 질문을 던져도 답을 얻을 수 없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유럽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 본격화된 5세기부터 약 1000년의 암흑기를 겪었다. 눈부셨던 헬레네·로마 문명 이후 문명의 발전은 멈춘 것처럼 보였다. 경제통계학자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예수 탄생 이후 1000년 동안 세계 인구의 1인당 소득은 고작 두 배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일어날 무렵인 15세기 초 대항해가 일어나며 역사상 가장 큰 문명의 혁신 여정이 시작됐다. 이어 16~17세기에는 과학 혁명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서구 사회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했다. 신대륙 발견, 자본의 축적,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화의 에너지를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1776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해 기계에너지를 사용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출간해 경제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쌓았고 신대륙의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사회의 역동성과 과학기술 혁신이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지구 반대쪽 조선은 영·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학(實學)이 일어나고 개혁을 시도하던 시대였다. 1776년 정조가 조선 22대 왕이 되면서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했다. 규장각은 왕실 기록물의 보관·관리뿐 아니라 연구 기능도 가진 싱크탱크로 실학을 연구했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정약용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조 사후 규장각 활동은 대폭 축소되고 국운도 쇠퇴해 갔다.
결과적으로 선진 문물을 도입해 근대화를 이루려고 한 조선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무엇 때문일까. 뿌리 깊은 유교사상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벼이 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사상에 사로잡혀 사회를 혁신시킬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역사상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모두 서구 사회가 주도했다. 지난 250여년에 걸쳐 줄기차게 지속된 과학기술 혁신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동성과 건전한 사회지배구조가 있었다. 대선후보들의 역사 인식이 궁금하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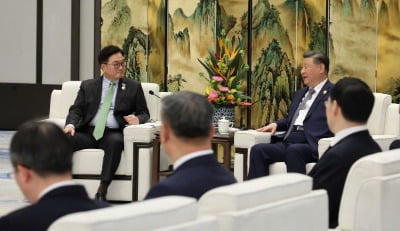
![이재명, '尹 헌재 증언' 쇼츠에 '낄낄'…빵터진 이유는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7980.3.gif)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