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구의 교육라운지] 대학 교수의 '장관 직행' 반댈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봉구의 교육라운지] 대학 교수의 '장관 직행' 반댈세](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626693.1.jpg)
이러한 속성의 교수들이 대선캠프에 몰려든다. 어떤 후보의 캠프는 참여 교수만 1000명을 넘어섰다. 자연히 ‘쉐도우 캐비닛(예비 내각)’에 교수들이 꾸준히 거론된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화된 교수 출신 기용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괜찮을까?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마뜩찮다. 안종범, 김종, 김상률, 김종덕…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초유의 ‘장미 대선’에 일조한 조력자들의 자취가 채 가시지 않았다. 장관, 차관, 수석 등의 자리에서 일을 저질렀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교수였다.
교수들 스스로 문제라 여기고 있다. 최근 교수신문과 엠브레인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1.3%가 “폴리페서는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 대상은 다름 아닌 교수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수사회의 문제점으로도 ‘무분별한 정치 참여’(29.5%)를 첫 손에 꼽았다.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의 위험성을 안다. 교수의 사회참여(앙가쥬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 상아탑에 틀어박혀 연구에 골몰하는 학자만이 참된 교수라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교수의 사회참여, 얼마든지 하자. 꼬아 보지도 말자. 단 지위에 연연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곤란하다. 교수들이 흔히 임명되는 장관직을 예로 들자. 장관은 한 정부 부처의 장이다. 거대 조직의 리더다. ‘네거티브형’에 ‘독고다이’ 스타일이기 십상인 교수가 조직의 생리에 대한 체득 없이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평교수가 장관으로 직행하는 관행은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교수가 장·차관 아래 급으로 가는 걸 민망해하거나 말리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 격(格) 그만 따지자. 얼마나 그 일이 맞는지, 교수로서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물론 교수가 조직의 실무를 익힌 뒤 수장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에는 절대 찬성한다.
장관은 내각의 일원이자 조직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때로는 대통령에게 그 조직의 논리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전문성에 조직 장악력이 더해져야 그게 가능하다. 조직의 생리를 모른 채 내려앉은 ‘대통령 바라기’ 장관에게는 바라기 힘든 덕목이다.
곧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내각이 들어선다. 더 강하고 더 잘하는 교수 출신 장관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 직행하지 말았으면 싶다. 완행으로 세세한 모습을 새기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으면서 가면 커리어가 풍성해진다. 돌아갈수록 조직의 리더로 성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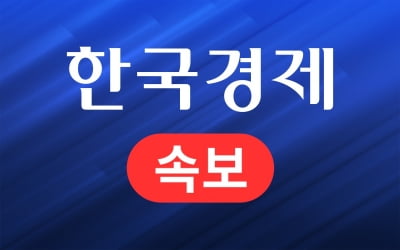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