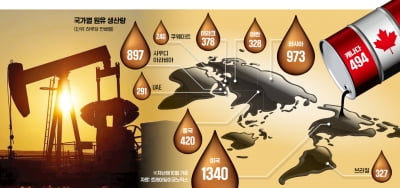다큐식 산문 '아연소년들' 출간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사진)의 《아연소년들》(문학동네)은 1979~1989년 발발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혹상을 전하는 다큐멘터리식 산문이다.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수백 명의 참전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해 책에 녹였다. 이른바 ‘목소리 문학’이라고 불리는 장르다.
저자는 책에서 “역사를 사람의 크기로 작게 만드는 일, 필사적으로 오직 그 한 가지에만 매달린다”고 말한다. 전쟁 이후 살인자가 된 참전병과 살인당하는 자, 또 그들의 가족에게 전쟁이 얼마나 치명적 상흔을 남겼는지에 집중하는 이유다.
참전자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해 읽어내려가기 어렵게 한다. “우리 병사들 팔다리를 자르고 과다출혈로 죽지 않게만 지혈기로 싸맨 다음 그대로 버려두는 거야. 우리더러 몸통만 데려가라는 거지. 그 병사들은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치료를 받게 해.”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어요. 생각하고 말고 할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거기서만큼 간절히 삶을 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전 소년병의 어머니들도 절규한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죠? 왜 우리 아들이 아연관에 담겨와야 해요? 밤이면 모든 이를 저주하다가 아침이 오면 아들 무덤으로 달려가 용서를 빌어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다. 참전병은 악몽과 불면증,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다. 전쟁터에서의 기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자살 시도를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빈번했다. 살인자가 된 소년병의 어머니는 “차라리 아들 무덤 옆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울부짖는다. “전쟁터에선 메달과 훈장까지 수여했던 일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왜 우리 아들만 심판대에 세운 거죠? 살인을 가르친, 우리 아들을 그곳으로 보낸 사람들은요?”
출간 3년 뒤 저자는 인터뷰한 아프간전 참전 군인과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속에서 스러져간 젊은이들을 영웅으로 박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였다. 그 과정에서 치러낸 재판 일지도 이 책의 마지막 장에 고스란히 담았다.
알렉시예비치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삶을 결딴 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증오한다”며 펼친 최후진술은 또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될 만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