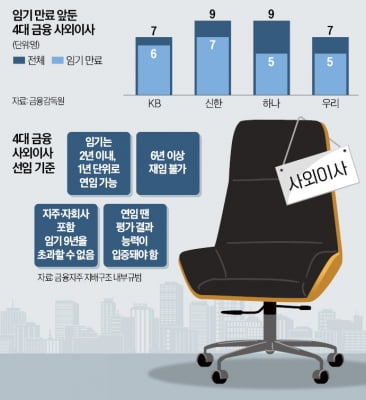특허 세계 6위인데 규제에 가로막혀 사람 대상 연구 없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의 비임상연구는 미국이 4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7건 20%) 한국(5건 6%) 독일(4건 5%) 순으로 나타났다. 비임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전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에는 한참 뒤지지만 동물실험 건수는 세계 3위로 유전자 가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 가장 최근 개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도 여섯 건 보유하고 있다. 미국(170건) 중국(55건) 유럽(18건) 영국(9건) 일본(7건)에 이어 세계 6위다. 국내 바이오벤처 툴젠이 선두 주자다. 그러나 임상연구는 미국 9건(53%), 중국 5건(29%), 영국 3건(18%)으로 한국은 한 건도 없다.
바이오업계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 47조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이 밖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만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체외에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 교정한 세포를 인체에 주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전자 가위를 바로 체내에 넣는 것은 생명윤리법상 불가능하다”며 “생명윤리법이 모호한 데다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임상 전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를 잘라내고 정상 DNA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 에이즈 등 난치성 질환자의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동·식물 개량, 해충 박멸을 위한 유전자 조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몰락한 세계 2차 대전 요새…다시 일으킬 열쇠는? [K조선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28023.3.jpg)
!["중국인 반응 폭발"…'6000만원 車' 보름 만에 13만대 팔렸다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31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