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복구 돕고 우방 확보한 마셜플랜이 성공한 '미국 우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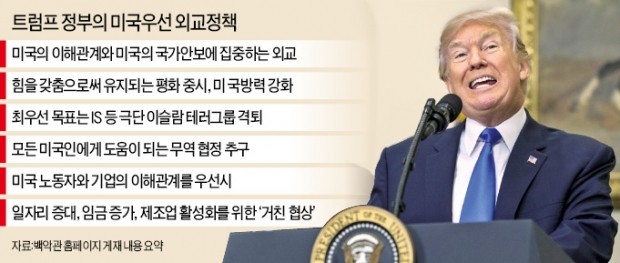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였다면 어땠을까. 미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8000억달러를 유럽에 퍼붓자는 구상이나 국제 질서를 세우자는 얘기는 비웃음을 사기 딱 좋아 보인다.
트루먼이 몽상가라서 이런 퍼주기 정책을 쓴 걸까. 아니면 미국은 원래 유럽과 친했으니까 의리로 그렇게 한 걸까. 그렇진 않다.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CFR) 국제경제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마셜플랜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미국 우선주의’의 대표적 성공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트루먼 정부는 전후 피폐해진 서유럽이 빠르게 복구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의 대중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에 기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미국의 물리적,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마셜플랜을 통해 16개 대상국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부·기업·근로자 간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는 것은 유럽의 시장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트루먼 대통령과 조지 마셜 국무장관은 이 지점에서 미국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의 속내가 따로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과잉 생산한 물건을 유럽에 팔아먹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스틸 국장은 당시 미국제조업협회(NAM)와 상공회의소 등 재계 조직은 미국의 과잉 생산 수출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셜플랜은 미국 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 미국의 수입을 확대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유럽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단순히 유럽에 돈을 꿔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냥 돈만 꿔줬다면 유럽은 끝없는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독일은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독일의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하고 독일이 자본재 수출국의 위상을 회복하며 서유럽 다른 국가들이 만성적인 달러 부족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국이 원래부터 유럽과 친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퇴임사에서 “우리의 운명이 유럽의 어느 부분과 얽혀 들어가서 미국의 평화와 번영이 유럽의 야심과 이해관계와 변덕 등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0년대 미국인의 관점에서 마셜플랜은 결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으며, 세계 전체에서 미국이 담당하는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진된 일이라고 스틸 국장은 밝혔다. 마셜플랜이 냉전체제 이행 과정이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이는 마셜플랜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뒀다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설명에 힘을 더 실어준다.
당시 공화당의 대표적 고립주의자인 아서 반덴버그 상원의원은 “(미국령) 진주만이 (일본에) 공격당한 날(1941년 12월7일) 오후, 국제 협력과 평화를 위한 공동 안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며 “현실주의자라면 고립주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라고 회고했다. 반덴버그는 마셜플랜 자금 지원을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이끈 주역이 됐다. 지금 ‘세계 질서가 망가져도 나만 홀로 잘살 수 있다’는 막연한 몽상에 빠져 있는 것은 누구인지 역사가 되묻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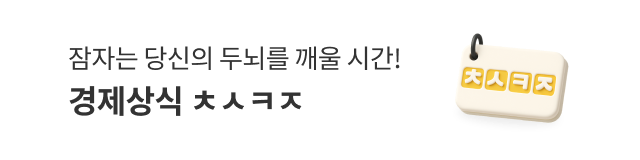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Fed 내 '금리인하 반대파' 등장…"인플레 여전" [Fed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A.422394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