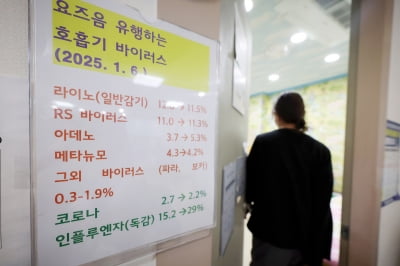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한국도 이런 골프장 있었나?"
세계 각국에서 문의 쏟아져
하루 평균 예약률 2.5배로↑
끊임없는 코스 리모델링으로
PGA투어 명품 코스 재탄생
노루 수컷들이 그린 파헤쳐
대회 열흘 전 '멘붕' 빠지기도

대회장을 책임진 안명훈 클럽 나인브릿지 대표(54)는 “투어 개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억 명이 방송을 봤을 테니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나인브릿지는 대회 폐막 이후 사흘간의 정리 기간을 거쳐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그 사이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한국에도 이런 골프장이 있었냐”는 놀라움에서부터 라운드를 하게 해달라는 읍소까지 각양각색이다. 국내 회원과의 동반 라운드가 필수인데도 11월 초까지 하루 평균 50팀씩 예약이 꽉 찼다. 평소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1996년 골프장을 지을 때부터 구상한 투어 개최였어요. 이후 매년 리노베이션 작업을 했으니 사실상 20년을 준비한 셈이죠.”
그룹의 모토인 ‘온리 원(only one)’이 클럽 나인브릿지 곳곳에 녹아 있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있는 하이랜드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리베티드 벙커벽’(잔디층을 여러 겹 쌓아 만든 주름벙커)은 클럽 나인브릿지가 국내 최초다. 퍼팅 그린을 공유해 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난도(難度)를 만들어내는 11번, 15번 홀이나 티잉 그라운드를 공유하는 12번, 16번 홀 등도 언젠가는 PGA 투어를 열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최초의 시도였다.
안 대표는 “전성기 때 타이거 우즈가 와서도 얼마든지 장타를 날릴 수 있도록 티잉 그라운드 위치를 유연하게 늘릴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우즈 티(tee)’를 우즈는 쓰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인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이 홀에서 461야드를 때려냈다.
PGA 투어 대회장으로 재탄생하는 데는 많은 품이 들었다. 대회 개최 석 달 전부터 마지막 코스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3주 전부터는 아예 휴장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 썼다.
“그린 모래도 20년쯤 지나면 노화합니다. 푸석푸석해진다고 할까요. 대개는 10㎝ 두께의 모래를 새 모래로 바꾸는데 우린 20㎝를 갈았어요.”
가장 어려운 작업은 18개 그린마다 다섯 곳씩의 핀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핀을 꽂을 다섯 개 지점을 중심으로 지름 8m짜리 원을 그렸을 때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며, 그 원 내의 경사도가 모두 2% 이상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린 크기를 대폭 키우고, 곳곳에 경사를 만들면서도 빠르기를 유지해야 하는 섬세하면서도 고된 작업이 반복됐다. 대회 기간 그린 어느 지점에 공이 떨어지든 모두 미세한 브레이크를 타 선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최적의 벙커 상태를 위해 18홀 전체 벙커 모래 밑에 특수 라이너를 깔았다. 물은 잘 빠지되 모래는 붙잡아두는 기능성 소재를 쓴 국내 첫 사례다.
그린과 그린 주변을 쉴 새 없이 손보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안 대표가 그린을 다 망쳐놨다. PGA를 열 수준도 못 된다’는 소문이 퍼진 것. 대회 개최 두 달여를 앞두고서다.
“그린 경도 강화를 위해 그린 표면을 긁어내는 ‘버티 컷’과 모래를 뿌려 틈을 메우는 ‘톱 드레싱’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잔디가 스트레스로 많이 죽었어요. 말라버린 잔디는 살리면 되지만 경도 강화 작업은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욕을 먹더라도 강행해야 했죠.”
가슴을 쓸어내린 일은 또 이어졌다. 번식기인 노루 수컷들이 그린에서 영역 싸움을 벌인 탓에 홀 전체가 망가진 것이다. 대회 개최 열흘 전 일이다. 그는 “간신히 복구하긴 했지만 ‘멘붕’이라는 말이 뭔지 그때 제대로 알았다”며 웃었다.
안 대표는 대회가 잘 마무리됐는데도 홀가분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했다.
“TV 중계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좋다는 말은 들어야죠. 아시아 최고라는 명성을 지키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골프브리핑] 타이틀리스트, 2025년형 프로V1·프로V1x 골프공 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0718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