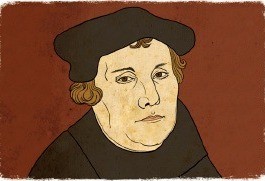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인 마르틴 루터(1483~1546)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순응할 수 없었다. 그는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설교할 때마다 이를 비판했다.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1517년 10월31일 엘베 강변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내걸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그의 논제가 처음부터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조심스러운 시도’였다. 그러나 ‘95개 논제’는 2주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으며 제후들과 지식인, 농민의 열띤 지지를 받았다. 얼마 뒤 그는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철회 요구’를 잇달아 거부함으로써 파면됐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나 교회 내 갈등을 넘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다. 루터는 내성적인 데다 말주변도 없어 토론할 때 어눌했다. 하지만 논쟁이 끝나면 상대의 모순을 신랄하게 공박한 기록물을 인쇄해 배포했다. 이로써 독일 민중의 폭넓은 지지와 결속을 끌어내며 개혁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교황청은 이를 얕잡아봤다. 뒤늦게 맞불을 놓으려 했지만 라틴어만 고집해서 독일 민중의 대부분은 읽지도 못했다. 루터와 지지자들은 15세기 발명품인 인쇄술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파급력을 키워갔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각 지역 방언과 이질적인 문화를 융합해 근대 독일어의 문장 체계를 확립했고 민족의식까지 키웠다. 루터가 없었다면 독일 통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유럽의 한 변방 수사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회 개혁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의 태동과 로마 가톨릭의 쇄신 외에 약 1000년간의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 각국은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국민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신성로마제국은 볼테르의 말처럼 ‘더 이상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존재가 됐다.
개혁을 촉발한 면죄부는 1563년 없어졌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로마서 3:10),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는 깨달음에서 출발한 루터의 개혁 정신은 500년이 지난 오늘도 ‘빛’과 ‘소금’이 돼 우리를 비추고 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에세이] 힘에 겨워 넘어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493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