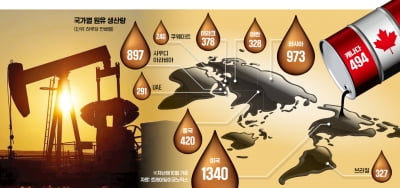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 위원 6명중 4명 인권법 출신
"재조사 중립성 훼손" 지적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추진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우려다. 김 대법원장이 지시한 재조사가 결국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탄식이다.
지난 1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조사 위원 6명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28기),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29기),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31기) 등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형률 부장판사(32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다. 6명 중 5명이 재조사해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칼자루(조사권)를 달라고 외치던 이들이다.
김 대법원장 ‘지원’ 아래 인권법 소속 판사들이 실세로 있는 법관대표회의의 위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위에는 우리법, 아래는 인권법’이라는 이야기가 법원 내에서 회자된다.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발표한 뒤 법관대표회의 측은 “환영한다”며 “대표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 주고 적극 지원해 주길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요청’도 아니고 무슨 권한으로 ‘요구’하느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법부가 ‘우리법-인권법’ 라인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출발부터 재조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전임 대법원장이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지금은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뚜렷하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무엇을 위한 재조사인지 갈수록 아리송해지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포토] 양자전략위원회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945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