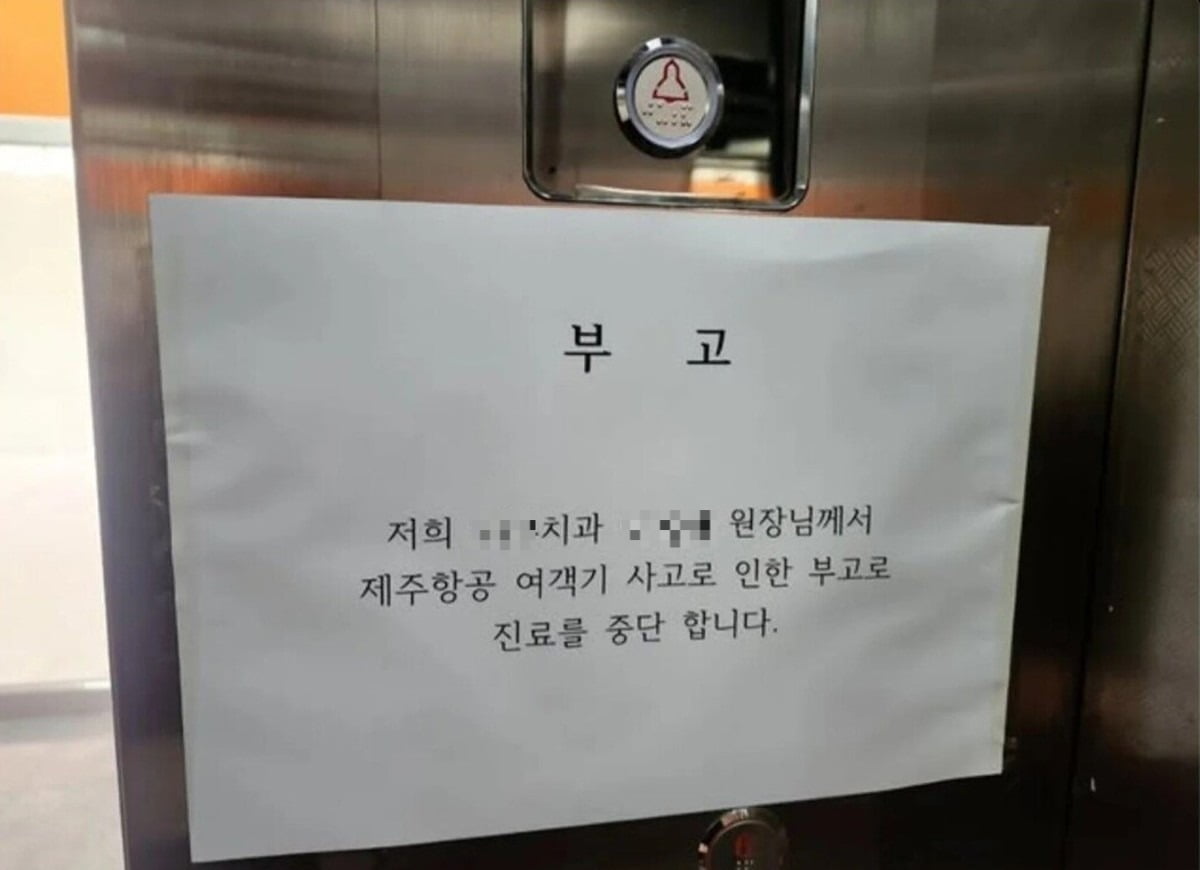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2) '흐르지 않는 고인 물' 한국 경제학계
미국 경제학계는 '스포츠 시장'
유능한 학자 스카우트 전쟁… 30대 경제학과장 발탁도
대학 간판보다 연구 우선… '노벨상' 크루그먼도 옮겨
한국 교수들 "정년까지"
상위권대 임용 땐 요지부동… 서울대, 개별 연봉협상 안해
"경제학은 시장 강조하는데 한국 경제학계엔 시장이 없다"
미국 경제학계는 스포츠 시장을 방불케 한다. 수시로 ‘스타 교수 영입전’이 벌어지고 능력만 있으면 30대에도 파격 승진이 가능하다. 뛰어난 교수가 많아야 대학의 지명도가 올라간다는 인식 때문이다.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진다. 반면 한국은 ‘고인 물’ 같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과거 한국의 교수 임용 시스템을 “주차장식”이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한국은 한 번 교수 자리를 꿰차면 정년퇴직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수 채용은 ‘한 명이 나가야 새로 한 명을 뽑는 식’으로 이뤄진다는 얘기였다. 이는 한국 경제학계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학계는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 주요 대학은 우수한 경제학자를 잡기 위해 거액을 쓰고, 교수들도 조건이 좋은 대학으로 옮겨간다. 서울지역 경제학과 A교수는 “미국에선 유망 경제학자를 모시기 위해 재정 여건이 좋은 경영대학원(MBA) 교수로 채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나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머 교수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게 단적인 예다.
물론 연봉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 경제학자 중에는 학풍이나 연구조건을 보고 대학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대표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대에서 2014년 지명도가 한참 떨어지는 뉴욕시립대로 이적했다. 당시 뉴욕시립대는 “우리 대학이 50여 개국에서 수집한 소득불평등 관련 자료가 크루그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경제학을 공부한 B교수는 “한국에선 교수들도 대학 서열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어느 대학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연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실험경제학을 개척한 공로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버넌 스미스가 수상 당시 무명에 가까운 조지메이슨대에서 연구한 게 그런 예다.
◆한국 대학은 사실상 ‘연공서열식’
한국 경제학자들도 자리를 옮긴다. 하지만 대부분 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일방향’이다. 한 번 상위권 대학에 자리 잡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수도권 대학의 C교수는 “외국 대학을 빼면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대 교수 자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렇다 보니 일단 서울대 정교수가 되면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할 동기가 급속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학 간 채용 경쟁도 없다. 스카우트 제도가 유명무실해서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교수 초빙 제도는 사실상 연례 공개채용이나 다름없다. 공개채용 지원서와 연구 실적,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추천서 등을 받아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다른 국립대 교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 쉽지 않고 학교에서도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남의 얘기다. 서울대 교수는 개별 연봉 협상을 하지 않는다. 연봉은 연구 결과보다는 근속연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나 성과 기대치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외국 대학과는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대 정교수 연봉은 최고가 1억1532만원, 최저가 8510만원으로 3022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스타 교수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미국과는 다르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은 시장을 강조하는데 정작 한국 경제학계는 시장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우물 안' 서울대, 나라 밖에선 40등
서울대 전체는 세계 28위… 경제학부가 등수 깎아먹어
논문 1건 당 인용은 172위
위기감에 변신 시도
2018년 뽑는 대학원 신입생 석·박사 과정 통합 운영
“해외 세미나에서 만난 외국 교수에게 ‘SNU(서울대 영문 약칭)에 있다’고 했더니 ‘언제 싱가포르대로 옮겼느냐’고 하더라. SNU가 싱가포르대 영문 약칭(NUS)인 줄 안 거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럽다”며 털어놓은 경험담이다. 그는 “NYU(뉴욕대), UCLA(캘리포니아주립대 LA캠퍼스), LSE(런던정치경제대)처럼 해외 유명 대학은 영문 약칭만 대면 다 아는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다”며 “서울대 간판 가지고 해외 경제학계에서 명함 내밀기가 힘들다”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경제학계 ‘넘버 1’이다. 하지만 해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매긴 올해 세계 대학의 경제학과 순위를 보면 서울대는 40위였다. 싱가포르국립대(20위), 홍콩과학기술대(24위), 도쿄대(30위), 베이징대(32위) 등 아시아 경쟁 대학에 밀린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서울대 평균에도 못 미쳤다. 서울대는 경영·사회과학 분야에서 종합 28위에 올랐다. 경제학부가 평균을 깎아먹은 셈이다. 학문적 명성만 보면 더 처진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고용주가 매긴 평판에선 16위에 올랐지만 논문 1건 당 인용실적에선 172위로 떨어졌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서울대 경제학부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 선발하는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현행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없애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제대로 된 박사를 키워내려는 시도다. 한 교수는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은 석사 과정 중심”이라며 “제대로 된 박사 프로그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해외 유명 대학은 대부분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기 대학 출신의 박사를 키워낸다.
반면 서울대는 그렇지 못하다. 박사 과정이 부실하고, 우수한 석사 졸업생들은 해외 유학을 떠나기 일쑤다. 서울대 경제학부조차 서울대 박사 출신 교수가 한 명도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한국 경제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한국판 NBER’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국가경제혁신센터’(가칭)를 세워 이론뿐 아니라 융합 연구를 통해 실물경제를 분석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NBER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약칭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15년전 노벨상 탄 행동경제학… 한국은 이제 겨우 '걸음마'
SKY 경제학 교수 105명 중 행동경제학 전공 2명뿐
올 학부강의 서울대가 유일
"한국, 학제간 융합연구 부족"

카너먼 교수는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개척자다.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에 반기를 들었다.
당시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의 변방’이었다. 하지만 ‘넛지(부드러운 개입)’로 유명한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대 교수가 올해 또다시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쥐면서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계의 신주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에서 행동경제학의 부상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행동경제학을 연구한 안드레이 슐라이퍼 하버드대 교수가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면서다. 이 메달은 미국경제학회가 40세 이하의 뛰어난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미래 노벨경제학상’으로 불린다. 이후 2001년, 2007년, 2013년 행동경제학 계열 학자들이 이 메달을 휩쓸었다.
반면 한국에선 행동경제학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05명(전임교수)을 분석한 결과 행동경제학 전공자는 2명(서울대 1명, 연세대 1명)뿐이었다.
이 중 올해 학부 과정에 행동경제학 과목을 개설한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대학생들이 행동경제학을 배우고 싶어도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 서울 유명 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는 A씨(21)는 “미시경제학 수업의 일부로 행동경제학을 배우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행동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경제학과에 왔는데 수리경제학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가 만 45세 이하의 우수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청람상’을 행동경제학자가 받은 것도 지난해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처음이었다. 새로운 경제 이론을 개척하는 데 한국이 그만큼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