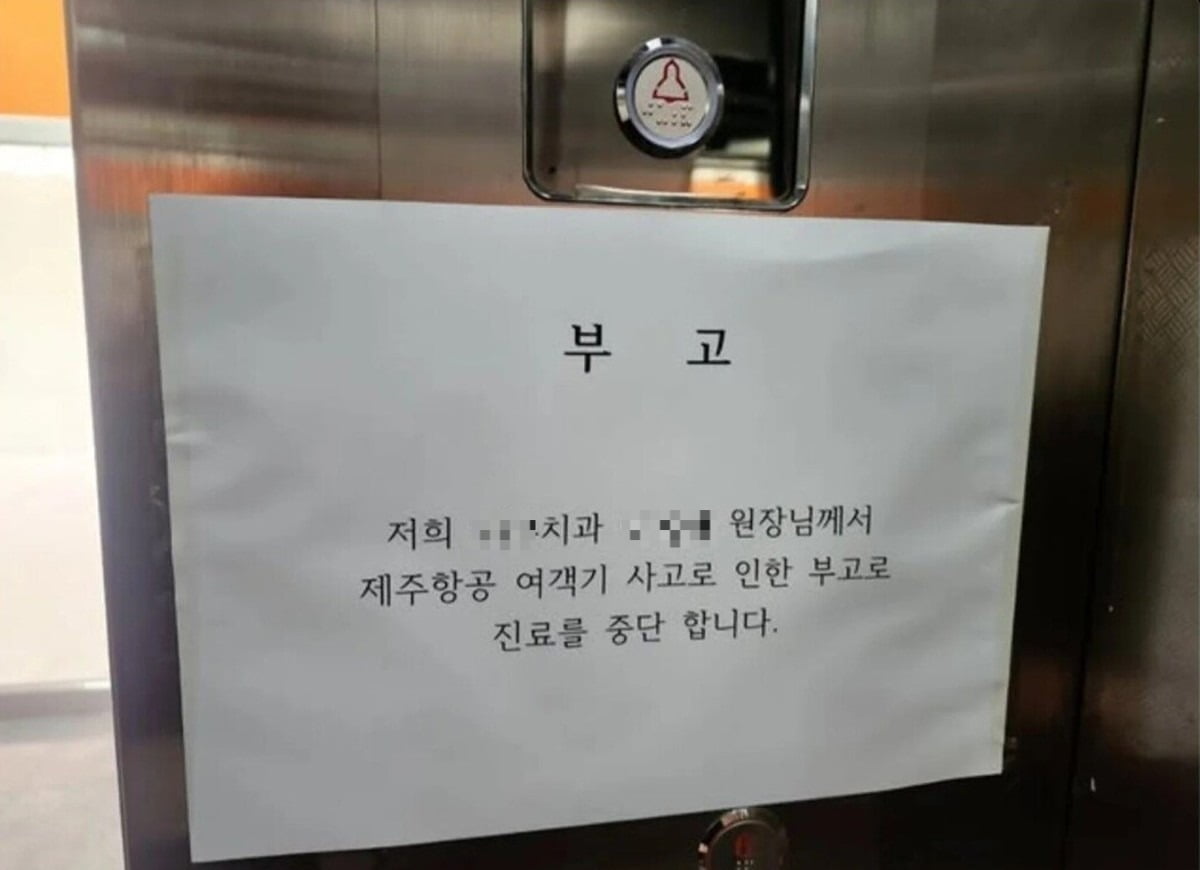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과학 소년·소녀들이 꿈을 키우던 과학관이 있었다. 1962년 창경궁 옆에 문을 연 국립서울과학관이다. 한때 이곳은 한국의 과학전시와 청소년 과학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노후화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 철거 위기를 맞았다. 원로 과학자들의 청원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이란 이름으로 지난 2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어린이과학관은 전시물에 상당히 신경 썼다. 70가지에 이르는 전시물은 직접 돌리고 만지고 발로 굴려서 힘과 소리, 촉감, 시각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처럼 시각에만 치중하던 기존 과학관과는 다른 모습이다. 핸들을 돌려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 물이 흐르는 원리를 보고 라디오 볼륨 스위치를 조작해 주파수를 바꿀 때마다 스피커 위에 뿌려놓은 가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주파수 개념을 익히는 코너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과학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 전시물은 ‘에너지 숲’이다. 키네틱 아티스트인 김동원 작가가 2년 넘게 걸려 개발한 이 기계장치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흡사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과도 같다. 공이 기계장치를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했다.
어린이과학관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만큼 체험형 전시물에 많은 돈을 투자한 덕분이다. 이정구 관장은 “사업비 317억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16억원을 전시물 제작에 썼다”고 말했다. 과학관은 성인 프로그램에도 신경 쓰고 있다. 해외 과학관처럼 어린이 관람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30분 이후 저녁시간 문을 열어 성인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아이폰 110만원 할인" 파격에도…반응 시큰둥한 이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66701.3.jpg)